2024년 수출 1조4400억 원 급증…美 기업들도 'K-뷰티' 표방, 정의 놓고 갈등
美 서울슈티컬스 "韓서 재료 조달" vs 韓 화랑 "韓서 제조해야"…공식 정의 없어
美 서울슈티컬스 "韓서 재료 조달" vs 韓 화랑 "韓서 제조해야"…공식 정의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2010년대부터 K팝, K드라마 등 한국 미디어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스킨케어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원하는 시청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약속하는 K-뷰티 제품을 구매했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1030만 달러(약 1조4400억 원)에 달하며 K-뷰티가 도약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본사를 둔 화장품 회사인 서울슈티컬스는 한국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정통 한국 스킨케어를 만든다고 한다.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되지만 재료는 한국에서 공급되기 때문이다.
서울슈티컬스의 소매 관계 이사인 앤 마제스키는 BBC에 "처음 시작할 때 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민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인기 스킨케어 브랜드 화랑의 공동 창립자인 김승구는 K-뷰티 제품이 한국산으로 간주되려면 한국 제조업체에서 제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브랜드는 한국적인 관점으로 컨셉과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김승구는 서플라이 체인 디지털에 말했다.
현재 K-뷰티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유일한 K-뷰티 무역 기구인 K-뷰티 산업협회는 설립할 계획이 없다.
그들은 단지 K-뷰티를 홍보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한다.
즉, 우리는 한국 뷰티에서 영감을 받은 미국 브랜드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한국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협정에 도달하여 한국 스킨케어 가격을 낮췄다.
미국인들은 K-뷰티 필수품을 어디서 구매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지난 몇 달 동안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
K-뷰티의 글로벌 성공은 놀랍다. 1조4400억원 수출은 한류의 경제적 파급력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K팝·K드라마가 견인한 한국 문화 열풍이 뷰티로 확산됐다"며 "아이돌의 완벽한 피부가 K-뷰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진위 논쟁은 성공의 부산물이다. K-뷰티가 인기를 얻자 다른 나라 기업들도 이 명칭을 사용하려 한다.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K-뷰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한국산'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슈티컬스의 주장은 흥미롭다. 미국에서 제조하지만 한국산 재료를 쓰니 K-뷰티라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재료 원산지를 강조하지만 제조 국가가 미국이면 K-뷰티로 보기 어렵다"며 "원산지 표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랑의 입장은 보수적이다. 한국에서 제조해야만 K-뷰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한국 브랜드들이 K-뷰티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은 당연하다"며 "제조 지역이 브랜드 가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정의 부재는 문제다. K-뷰티가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K-뷰티 산업협회가 정의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쉽다"며 "산업 보호를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관점의 제품 개발 강조는 중요하다. 단순 원산지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K-뷰티는 단순 화장품이 아닌 한국의 미용 철학과 문화가 담긴 것"이라며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진정한 K-뷰티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K-뷰티 영감 브랜드 증가는 양날의 검이다. 시장 확대이지만 정체성 희석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K-뷰티 열풍으로 모방 제품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진품과 모방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한 관세 인하는 호재다. 25%에서 15%로 낮아져 K-뷰티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업계는 "관세 인하로 미국 시장에서 정품 K-뷰티 제품 가격이 내려갔다"며 "현지 생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졌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긍정적이다. 정품과 영감 브랜드 중 선택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졌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다"며 "다만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뷰티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 산업 보호와 지속 성장을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K-뷰티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원산지·제조지·문화적 요소 등을 종합한 기준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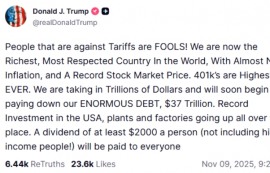

![[실리콘 디코드] 삼성전자, CES 2026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11009481906048fbbec65dfb5915244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