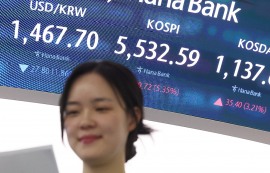무게감 느껴지면서도 스트레스 없는 가속감
한층 개선된 인테리어에 PHEV의 히든 매력
한층 개선된 인테리어에 PHEV의 히든 매력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대신 가속감은 매우 부드럽다. 고급스러운 차의 표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는 운전자는 이미 발끝에서도 품격을 느낀다. 이건 모터로 가든 엔진으로 가든 똑같다. 격조를 차린 우아함이다. 그렇다고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일반 모드에서도 세게 몰아붙일 수 있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전기차 느낌의 강력한 토크감까지 경험할 수 있다. 조용하게만 모는 차가 아니었다. 인상적인 것은 그동안에도 승차감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단한 하체인 듯하지만, 유연하다. 노면이 조금 거칠어도 여전히 엉덩이에서 물컹거리는 걸 느낄 수 없다. 코너링에서는 아주 무리한 공략만 아니라면 자세도 매우 잘 유지한다. 서스펜션에 세팅에서는 확실히 ‘렉서스’ 브랜드의 성향이 잘 묻어난다는 생각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시승한 렉서스 NX 450h+는 이전 모델과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에서도 살짝 업그레이드된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실내 구조도 많이 달라졌다. 렉서스가 자랑스럽게 꾸민 이 공간은 ‘타즈나(Tazuna)’ 컨셉이라고 한다. 승마에 있어 사람과 말이 일체가 돼 앞으로 나아가듯 차와 운전자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한다. 깊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모든 구성이 운전자 중심으로 돼 있다는 뜻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과도하게 커진 14인치 중앙 모니터다. 위치도 살짝 상단이다. 보기에는 좋으나 여전히 운전에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물론, 운전 중 조작이 안 되도록 해놨지만, 전방 시야에 모니터가 들어올 정도니 굳이 좋은 게 좋을 거라고 할 수만은 없는 문제인 거 같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인테리어 분위기는 한층 좋아진 느낌이다.
NX450h+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잊어버린 것 하나를 끄집어내야 한다. 바로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차체의 무게가 그냥 가솔린 차보다 500kg 이상이 더 나가는, 배터리를 바닥에 쭉 깔아 무게중심을 낮춘, 절반은 전기차라는 뜻이다. 양쪽 뒷바퀴 위에 주유구와 충전구가 있는 것도 쉽게 눈치채기 힘들다. EV모드로 전환하면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50km를 넘는다. 이땐 엔진 소음 걱정 따윈 접어둬도 된다. 모든 건 스티어링 휠 뒤편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에 다 표시가 된다. 토크감이 강력하게 느껴졌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엔진의 울림이 그리워질 때면 2.5리터 가솔린 엔진으로만 다녀도 상관은 없다. 선택지는 충분하니까. 충전의 불편함이나 연비가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품격 위에 앉아 전동화의 고삐를 쥐고 달리는 기분이라면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을 거 같다. 가격표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