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파리 사람들은 그냥 세느 강변을 거닐어.”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이 많은데..”
“플라뇌르(Flaneur)야.”
갑작스런 프랑스 언어에 말문이 막혔다. 이내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고층 빌딩이 없네요?”
“김 형은 눈이 맵네! 다른 관광객들은 그런 말 잘 안하는데”
“왜 그렇죠?”
“저런 사람들이 ‘플라뇌르’야.”
옛날에는 거북이를 앞세워 산책했단다. 거북이는 가급적 천천히 걷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행자 역할을 했다고 한다. ‘플라뇌르’들은 젊은 시절에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고 강 박사는 설명한다. 거북이와 같이 산책할 정도로 느긋할 수 있고, 무엇이든 아름답게 보이는 도시, 파리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파리 도시계획의 주역 ‘오스망’
오늘의 파리를 만든 주역은 ‘오스망’이다. 그는 1852년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하면서 세느 주지사(파리시장)로 취임했다. 17년간 세느 주지사로 있으면서 파리의 가로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가장 먼저 개선문이 위치한 ‘에두아르’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대로(Boulevard)를 설치했다. 전국으로 연결된 파리 시내의 각 역도 연결했다. 의도적으로 교통과 물류 흐름을 높였다.
세느 강가는 비슷한 파사드(건물 출입구 정면외벽) 건물로 정비했다. 건물 전체의 인상을 나타내는 장식적인 건축 양식을 갖추도록 규제했음을 의미한다. 공공시설도 집중 시켰다. 녹지와 가로등,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런 수고는 근대적 대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파리를 만들어 냈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철강 기업의 철강제품들이 기반 시설에 요긴하게 사용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왜 파리 구시가지는 고층 건물이 없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파리의 지반 자체가 수많은 석회암 채굴 터널이라는 취약점 때문이다. 파리 사람들은 에펠탑을 '그랑되르'(grandeur)로 삼는다. 철탑으로 유명세를 얻은 에펠탑이 장엄하고 웅대한 프랑스를 당당하게 대변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뜻이다. 프랑스에는 또다른 걸작이 있다. 이탈리아에만 팡테옹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이내 벗게 만드는 프랑스 팡테옹은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이다.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이 성녀 주느비엔느를 기리기 위해 처음 만들었다. 그 이후 루이 15세가 병이 나으면 성당을 크게 고쳐 짓겠다고 기도를 올린 뒤 지금과 같은 규모의 팡테옹을 만들었다고 한다.
높이 85m의 돔을 가진 신고전주의 양식(1789년)의 ‘팡테옹’은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영향을 받아 철제 구조의 돔을 3층으로 올렸다. 철강재는 석재로 건축하기 어려운 너른 돔을 단박에 해결했다. ‘팡테옹’은 석조 건축물이지만 내부를 철근으로 보강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팡테옹’은 1851년 ‘푸코’가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기 위해 ‘추의 실험’을 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 지하에는 ‘빅토르 위고’, ‘장 자크 루소’, ‘퀴리부인’ 등 80명의 위인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철근 콘크리트 공법은 철강 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이 공법은 프랑스 건설기술자 ‘프랑수아 엔비크’가 기틀을 마련했을 뿐 어느 누가 발명한 것은 아니다. 로마인들은 생석회와 포졸란(화산재), 경석 골재(화산암의 일종)를 섞어 ‘오푸스 캐맨티시움’이라는 콘크리트를 만들어 썼지만, 인장력이 약해서 쏟아 붇지 못하고 수작업을 해야 했다. 콜로세움, 판테온 등은 '오푸스 캐맨티시움'으로 만든 건축물들이다. 이 콘크리트는 로마제국의 몰락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첫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는 ‘오귀스트 페레’
철근을 삽입한 철근 콘크리트는 1855년 제1회 파리만국박람회에서 프랑스 ‘랩보트’(Lambot)가 철망을 넣은 콘크리트 선박을 출품해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시작된다. 1861년에는 ‘조지프 모니에’(Joseph Monier)가 시멘트 화분을 철망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리고 1867년에 ‘모니에식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특허를 받은 이후로 파이프와 탱크(1868년), 평판(1869년), 교량(1873년), 계단(1875년)으로 발전해 나갔다.
철근 콘크리트 첫 주거 건물은 1903년 ‘오귀스트 페레’와 ‘구스타브 페레’가 파리 프랭크린가에 지은 아파트 건물이다. 그러나 19세기의 건축가들이나 귀족들은 철을 이용하여 지은 대형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지 않았다. 귀족문화에 젖은 기득권층이 궁전과 같은 고전 석조건축물을 정통 건축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모파상 조차 “에펠탑은 파리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라고 혹평할 정도로 철강재 건축물들은 천대를 받았다.
당대 예술가들의 오만한 시각은 20세기 초까지 지속됐다. 철골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 건축은 근본 없는 기술자들이나 만드는 방식이라고 도외시 했다. 하지만 철근으로 보강한 건축물은 의외로 곳곳에서 발견된다. 철이 워낙 다양한 쓰임새가 있어서 건축자재로 적극 활용되는 시대가 스스로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엄두조차 못 냈던 인간의 희망 사항은 단번에 해결됐다. 강물 위에 교량이 놓이고, 도시생활을 가능케 하는 넓은 공공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고층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됐다. 철강재는 돌에 비해 200배 이상 인장 강도가 크다는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철강재는 새로운 창의를 이뤘다. 돌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반죽과 철근을 결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만들었고, 철이 돌의 역할을 대신한 철골(Steel Structure) 구조를 탄생 시켰다. 물론 그 이전에 철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었지만, 철은 가장 비싼 건축 재료였기 때문에 건축에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구조를 가장 먼저 활성화 시킨 나라는 프랑스이다. 그만큼 프랑스는 철강 산업과 연관된 최초의 기록들이 많고, 철을 다루는 엔지니어를 비롯해서 이공계 엔지니어를 가장 먼저 육성하고 신뢰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독일, 영국, 미국 순이다.
프랑스 16세기부터 이공계 정책 우선
프랑스는 16세기부터 공학교육을 시작했다. 1794년에는 나폴레옹에 의해 ‘에콜 폴리테크닉’을 설립하고 엔지니어들을 배출했다. 이들은 국가의 최고 엘리트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국가사업을 독점하는 특권까지 행사했다. 민간 주도의 각종 공예학교(지금의 사립공대)들도 이 시기에 설립되고 이공계 인재의 양성이 활발히 전개됐다. 철 구조물의 귀재였던 ‘에펠’은 ‘에콜 폴리테크닉’이 아닌 사립 공예학교 출신이다. 그가 ‘에콜 폴리테크닉’의 인재들과 경쟁을 하면서 가르비교,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등의 철 구조물을 제작한 대가로 명성을 올리게 된 연유도 일찍부터 엔지니어를 신뢰하는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브이그’와 같은 세계적인 건설 기업이 프랑스 국적이라는 점은 120년 이상 된 토목전문 공과대학이 포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가 지금도 공업국가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전통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앞세운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철강기업들이 설비 합리화를 게을리하지 않고, 엔지니어를 양성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엔지니어를 신뢰하는 프랑스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세느 강 위에 건설된 37개의 다리들은 저마다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감각이다. 이 다리들은 프랑스가 철강 강국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물들이다. 100년이 훨씬 넘는 시기에 건설된 다리에는 부조로 조각된 갖가지의 형태가 묘사되어 있다. 횃불을 들거나, 망치로 철을 두드리는 대장간 모습도 보인다. 고정된 다리 구축물들은 마치 뭔가를 이야기하는 듯 살아 숨 쉬는 느낌이다.
프랑스가 예술의 도시라는 점에 이견은 없지만 주변에 설치된 구조물들을 자세히 보면 파리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으뜸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게 된다. 아주 오래전 철의 시대가 시작될 무렵, 프랑스 엔지니어들의 과감한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파리는 맹물 같은 도시였을 것이다. 건축물에 철을 과감히 채용한 그들이 있었기에 연간 1,000만 명을 넘는 관광객들이 파리를 찾는지도 모를 일이다.
흉물이라고 혹평했던 에펠탑을 철거했더라면, 파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 석조로 건설된 개선문과 철로 구축된 에펠탑의 공간 사이에는 나폴레옹의 이공계 육성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결과론이 담겨 있었다. 철강과 같은 국가 기초산업의 육성은 이렇게 수세기를 지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파리에서 재인식하게 된다.
K팝이 성공가도를 달리자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폭 줄었다는 뉴스는 철강인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K팝이 전 세계에 더 큰 붐을 일으켜야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젊은이들이 엔지니어링 분야만은 외면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종대(글로벌이코노믹 철강문화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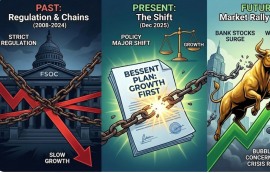

![[뉴욕증시] AI 관련주 약세 속 3대 지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21306330308913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