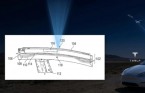3·4세 오너로 '세대교체'…실세·2인자 안두고 '사장단'과 직접 소통 선호
승진자 없고 퇴진행렬…부회장 타이틀 줄어들어
승진자 없고 퇴진행렬…부회장 타이틀 줄어들어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직장인의 최고직급이자 그룹의 이인자로 불리며 오너를 대신해 그룹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회장들이 줄어들고 있다. 과거와 달리 새로운 총수들이 소수 측근 그룹을 두지 않고 계열사 대표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룹을 장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4대 그룹 임원 인사의 공통된 핵심은 '세대교체'였다. 특히 부회장 승진자가 없었고 오히려 기존 부회장 중 일부는 퇴임했다. 재계의 부회장 직급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SK는 지난 7일 그룹 최고협의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수펙스)를 열어 의장 등 신규 선임안을 의결하고, 각 관계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표이사 등 임원 인사 내용을 공유·협의했다.
LG그룹은 '44년 LG맨'이었던 권영수(66)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용퇴했다. HD현대에서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41)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가삼현(66)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과 한영석(66) HD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대자동차그룹엔 비(非)오너가 부회장이 아예 없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측근으로 노사 문제를 전담했던 윤여철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지난 2021년 퇴진하면서, 부회장 직위는 정의선 회장의 매형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1명뿐이다.
재계에서 가장 먼저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조직개편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경우 부회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을 총괄하는 한종희 부회장과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을 이끄는 경계현 사장이 자리를 지키며 '투톱'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너 일가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직급이 부회장이다. 직장인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이다. 부회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현재 계열사의 오너로 있는 사장단이 한 단계 더 진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
대부분 오너 3·4세로 승계가 이뤄지면서 세대교체도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들 젊은 총수들은 소수 측근을 통하기보다 사장단 중심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자를 두지 않고 계열사 대표들과 직접 소통하는 직할 체제를 구축하는 게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한 그룹 장악력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회장 직급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오너들의 연령대가 젊어졌고, 직접 소통 방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관리형 부회장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직접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그룹 장악력도 높일 수 있어 새로운 오너들이 이같은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실리콘 디코드] 日 라피더스, '유리 인터포저' 공개…TSMC 아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21809292001056fbbec65dfb59152449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