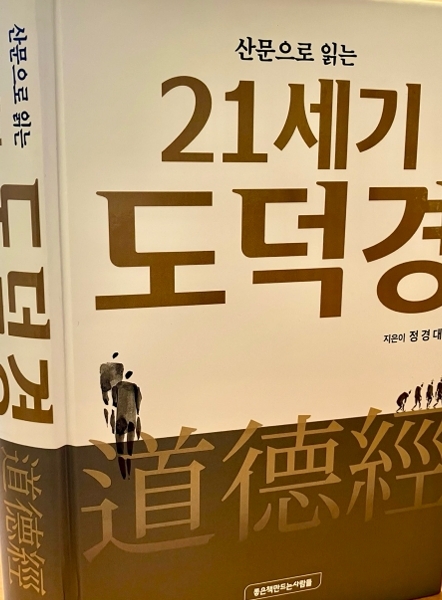'산문으로 읽는 21세기 도덕경' 제18장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씨족사회가 부족사회와 국가라는 집단 사회로 진화하면서 사람들의 성정이 점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도둑이 들어 소를 훔쳐 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재산 1호 소를 도둑맞은 농부는 망연자실했다. 그리고 이웃을 의심하고 도둑맞지 않을 지혜를 짜낸답시고 외양간을 고치고 문을 닫아 걸었다. 거기다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에게 죄를 묻는 법칙을 세웠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법칙이 생겨나고 그 법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는 갖가지 제도가 생겨난 것도 무위한 인간 본성이 세속적 탐욕에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외양간을 내버려 두어도 소를 잃지 않을 때까지는 사람의 올곧은 본성 도리가 관습이어서 무위의 도가 물처럼 흘렀다. 하지만 소를 잃고 나서는 무위한 도가 무너지고 작위적인 법칙이 생겨났다. 작위적 법칙이란 올가미와 같다. 그러나 세속적 탐욕은 언제든 법칙이란 올가미를 교묘하게 벗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위선과 거짓이란 함정에 빠져서 죄가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뻔뻔한 행태를 보인다.
이에 노자는 말했다. 사람의 도리(大道)가 무너지고 나서야 인의(仁義)가 있었다. 사람의 도리란 본성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성품이다. 인의가 바로 어질고 바른 언행이다.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람의 도리와 같은 뜻이다. 그러함에도 인간은 입으로는 인의를 내세우면서도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지키지 않는다. 인의가 무너지니 민심이 흉흉해지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천지의 이치는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전개되는 법, 인간은 자연히 인의를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도가 저절로 행해지는 자재율(自在律)이 법이 없는 법으로서의 진정한 도리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본성을 지키는 마음 닦는 수행을 함으로써 법에 매이지 않아도 인의를 무위로 행하는 참 도인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자재율이란 한민족의 창세신화 '부도지(符都誌)'에 실린 한민족 사상과 철학의 시원이며 노자의 무위 철학의 원형이다. 자재율이란 가령 나무가 탄산가스를 흡수해 탁한 공기와 물을 맑게 해주고 인간을 비롯한 일체 생명에게 먹을 것을 무위로 베풂을 의미한다. 그에 반하면 유위가 된다. 반드시 일체 생명에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규범, 즉 유위법을 만들어내면 무위한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서 노자는 말했다. "지혜가 나타나고 나서야 꾸며낸 지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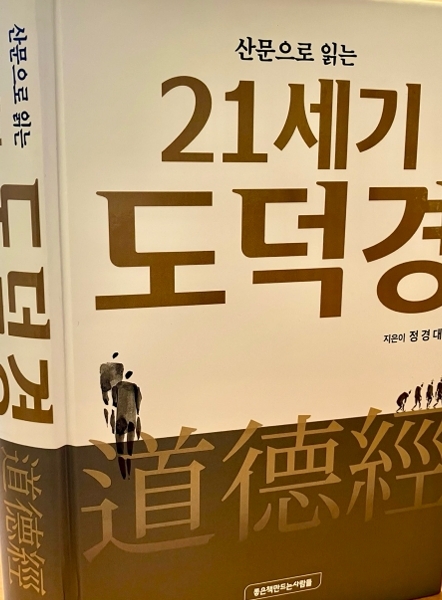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경대 한국의명학회 회장(종교·역사·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