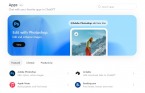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중앙은행에 이처럼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하게 된 데에는 그 나름의 역사적 교훈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대 권력자들은 돈을 마구 풀어왔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거나 유지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통화의 증발(增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낳는다. 전쟁배상금을 갚는다면서 마르크화를 대량으로 찍어냈다가 수천 퍼센트(%) 이상의 물가 폭등을 야기한, 1차 대전 이후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결국 히틀러라는 괴물을 낳았다. 경복궁을 짓는다면서 당백전을 찍었다가 결국은 왕조 멸망의 단초를 만든 대원군도 그 예에 속한다. 이 같은 권력의 통화 증발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중앙은행 독립성이다.
성공한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경제학도라면 중앙은행을 왜 만들었는지 그 역사적 연원과 이유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연일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폭까지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금리 인하폭은 3%포인트다.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연 4.5%다. 이를 최소한 1.5%로 낮추라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왜 하필 3%포인트일까? 여기에는 트럼프 나름의 치밀한 계산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는 37조 달러를 조금 넘어서 있다. 그 대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꾸어 가고 있다. 국채에는 이자가 따른다. 요즘 미국 국채 금리는 4%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국채 발행 물량이 37조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이자로 나가는 돈이 37조 달러에 0.04를 곱한 1조48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자를 3%포인트 낮춘다면 37조 달러에 0.03을 곱한 1조1100억 달러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3%포인트 낮춰주면 1조11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1조1100억 달러를 달러 당 1400원의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1554조 원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한 해 예산 규모가 700조 원 남짓이다. FOMC가 기준금리를 트럼프의 요구대로 3%포인트 인하하면 미국 정부는 해마다 우리나라 2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거액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파월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해마다 1554조 원씩의 국고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채를 뜻대로 발행하지 못했다.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국가부채가 이미 한도에 육박해 있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지배하고 미국 의회는 최근 이른바 트럼프 감세예산으로 불리는 OBBB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채한도를 기존의 36조 달러에서 41조 달러로 무려 5조 달러나 늘려주었다. 트럼프 정부는 OBBBA 법이 공식 발효되는 10월 1일부터 대규모로 국채를 찍어낼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아낸 셈이다. 올 4분기에 트럼프가 국채를 무더기로 발행하면서 뉴욕증시에 국채 발작이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트럼프가 4분기에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 발행이자, 즉 국채 금리가 금융시장에 발작 증세를 야기할 수 있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지금 4% 수준에서 거래되는 국채 금리가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곧 국채값의 폭락을 의미한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미국 국채가 안 팔리면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그 돈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봉합하고 나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른바 마가(MAGA)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구상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틈만 나면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윽박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디폴트 위험국으로 분류돼 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OBBBA 법에서 거의 대부분 수용되면서 디폴트 위험은 더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OBBBA 법 시행으로 2034년까지 연방 적자가 3조4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에 당면한 긴급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를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는 차입을 늘릴 수도 있다. 현재는 이런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재정적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나 팬데믹 시기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번 OBBBA 법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5조 달러나 늘렸다. 한도 부족에 따른 디폴트 우려는 당분간 막을 수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디폴트 위험은 훨씬 더 높아졌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말)에 1조8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른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35년까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9%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공공부채는 현재 GDP의 약 100%에서 1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946년 이전 기록인 106%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채권왕' 빌 그로스 핌코 공동창업자는 "정부가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까지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쓰는 10대처럼 군다"고 비판했다.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증가는 국채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채 물량이 많아지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채 과잉 공급이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상황도 아니다. 관세 폭탄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 폭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파월의 금리 인하 전쟁의 이면에는 국채 폭탄과 디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