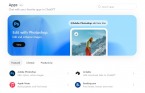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국제정치학 박사)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2023년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언론의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었지만, 회의장 한편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까다로운 45V 기준을 테이블에 올렸다.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이 시간 단위로 재생에너지와 매칭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 어떤 국가도 시도하지 않은 엄격한 요구사항이었다. 유럽연합은 RFNBO 기준으로 맞섰고, 일본은 그레이 수소라도 CCS 기술을 결합하면 청정수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내세웠다. 한국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춰가겠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수소 시장과 표준을 누가 설계할지 결정하는 패권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표준이 곧 보조금 지급의 근거이자 무역 허용의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기준(Rule)을 정하는 자가 글로벌 수소경제의 입법자가 되는 것이다. 태양광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룰을 바꿔버렸듯, 서구 선진국들은 수소만큼은 '표준 선점'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다.
사우디의 네옴, 호주의 헌터밸리 등 수소 수출 프로젝트는 늘고 있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사우디의 1.5달러 수소가 한국에 도착하면 액화·수송·재기화 비용이 더해져 최소 68달러가 된다. 이는 국내 그레이 수소 생산비용의 23배다. 더 큰 문제는 투자 역설이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설비처럼 20~30년 수명 시설이 3년 단기 계약만으로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한국이 수소 분야에서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잠재적 수요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수소환원제철(연간 370만 톤), 석유화학 기업들의 공정 전환(150만 톤), 현대차의 수소 모빌리티(50만 톤), 그리고 발전 부문의 혼소·전소 발전 계획(200만 톤 이상)까지, 모두 합치면 연간 800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치명적 약점이 있다. 가장 큰 수요처인 발전 부문에 수소를 구매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철강, 화학, 반도체 기업들은 직접 구매할 수 있지만,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수소를 소비할 발전 부문은 다르다. 한국전력은 발전 연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으며, 발전자회사들은 전력시장 경쟁 때문에 비싼 수소 채택을 꺼린다. 이 구조적 공백은 한국 수소 외교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린다.
핵심 무대는 울산이다. 국내 최대 부생수소 공급지이자 수소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단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플랜트, LNG 터미널과 연결된 수소 인프라, 현대차의 수소 상용차 생산기지를 갖춘, 완전한 수소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 관건은 개별 기업의 수소 수요를 통합해 해외 공급업체와 협상할 수 있는 ‘집단 구매력’을 만드는 것이다. 포스코의 100만 톤, 석유화학 단지의 50만 톤, 발전소의 30만 톤을 따로 조달하는 것과 180만 톤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게임이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주기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천명했다. 발전 부문 구매 주체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정부 전략에 '국가 수소 구매 기구'와 '장기계약 기반 집단조달 제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독일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수소 구매 전담 기구를 만들었고, 일본은 공공기관이 직접 투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