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오랜만에 만난 숲 친구들과 무의도행 버스를 타고 큰무리선착장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내리던 선착장이었지만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이면서 오히려 한산해진 듯하다. 우측으로 바다를 끼고 숲길로 접어드니 제일 먼저 굴피나무 군락지가 눈에 들어온다. 굴피나무는 산기슭의 양지바른 곳이나 바닷가의 수성암 지대에서 주로 자라는 가래나뭇과의 교목으로 20m 정도로 자란다. 5, 6월에 노란빛을 띤 연녹색 꽃이 핀다. 열매는 솔방울 모양으로 검은빛을 띤 갈색이다. 예전엔 이 열매로 머리를 빗기도 했다고 한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벗을 위해 열매를 주웠다. 바다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무의도 둘레길이지만 흐린 날씨 탓인지 바람 소리, 파도 소리만 가득할 뿐 인적이 드물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무의도에서 만난 도둑게는 참 재밌는 친구다. 이름처럼 가정집 부엌에까지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는 도둑게는 굉장히 빠르고 영리해 살아있는 곤충도 사냥한다. 과일이나 음식물 쓰레기까지 가리지 않는 잡식성이라고 한다. 흔히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汽水) 지역이나 해안과 가까운 습지에 많이 산다. 참게와 도둑게는 우리나라 게 중 뭍에서 사는 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도둑게만이 유일하게 나무와 줄을 타고 기어오를 수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우월한 생존능력을 지녔다. 하지만 종족 보존과 번식이란 ‘천형(天刑)’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것은 바로 산란을 위해 반드시 바다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8∼9월 만조 시기에 맞춰 알을 바닷물에 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무렵 지역에 따라서는 해안가 도로를 가득 메운 도둑게의 행렬이 목격되기도 한다.
숲을 잠시 지나 다시 해안에 이르니 솔숲 옆으로 순비기나무가 바다를 향해 넝쿨을 뻗고 있다. 보라색 순비기꽃이 물방울을 머금은 채 우리를 반긴다. 제주에서 해녀들이 물질할 때 참고 또 참았던 숨을 물 밖에 나와 내뱉으며 내는 소리를 숨비 소리라 하고, 해녀가 바다에서 나와 숨을 비우고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숨비기라 한다. 이 나무의 뿌리도 모래땅 속으로 길게 뻗으며 살아남고자 애쓰는 모습으로 보여서 숨비나무라 불리다가 순비기나무라는 이름으로 변했다고 한다.
실미도가 보이는 해변을 지나 모퉁이를 돌아서 하나개해수욕장이 보이는 곳까지는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걷는 길이다. 하나개는 큰 갯벌이란 뜻이다. 간간이 빗방울이 떨어지긴 해도 바람이 시원하기만 하다. 그 길 어디쯤에서 애벌레에서 막 나와 풀에 매달려 날개를 말리고 있는 호랑나비를 만났다. 마지막 5령 애벌레에서 날개돋이가 성공하면 펄럭이며 몸을 말린다. 이때는 날지를 못 하니 공격당하기 쉽다. 거친 바람과 비, 햇빛, 힘센 곤충들과 거미 등 피해야 할 게 참 많은 세상이고 보면 삶은 누구에게나 고해를 건너는 일인 듯하다. 가을 길목에서 춤추는 섬, 무의도를 걸으며 모처럼 바다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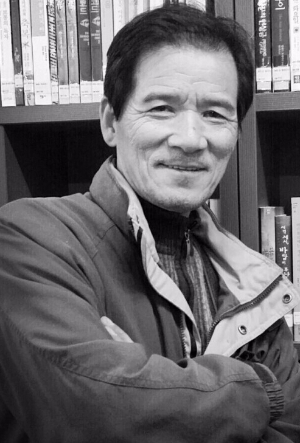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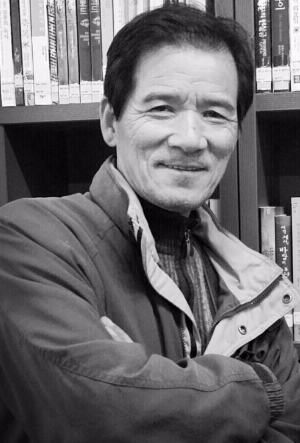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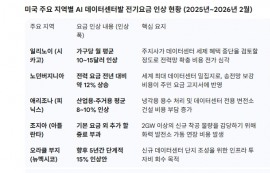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으로 혼조세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703563309056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