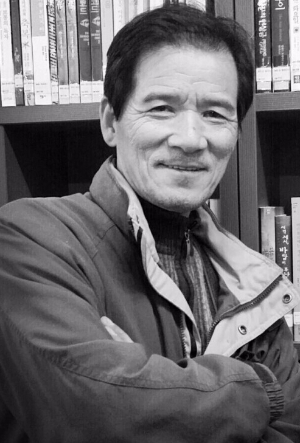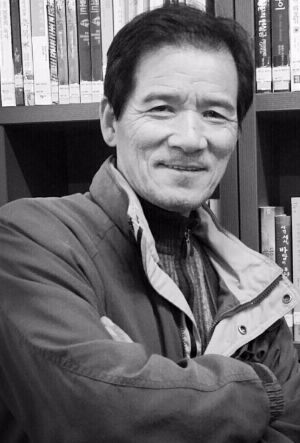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벚꽃이 피면 온 나라가 벚꽃 축제로 한바탕 들썩인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꽃은 장미,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라지만 꽃과 나무를 통틀어 가장 조직적으로 사랑받는 꽃은 벚꽃이 아닐까 싶다. 기상청에서는 해마다 벚꽃의 개화 시기를 알려주고 지자체들은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를 기획한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가로수 수종은 벚나무다. 하지만 이제는 딱히 소문난 벚꽃 명소가 아니라 해도 어디서나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벚꽃이다. 벚꽃 축제를 열기 위해 지역마다 공격적으로 심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가로수 중에 가장 많은 나무도 벚나무라고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벚나무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은 연간 9.5㎏에 이른다. 수령 25년쯤 된 벚나무 250그루가 1년간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2.4t을 흡수한다고 한다.
벚나무는 버찌 열매가 달린다고 해서 벚나무라고 부른다. 유년 시절, 뒷산을 오르내리며 달콤한 버찌를 따 먹던 기억은 아직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야생에서 자라는 벚나무는 크게 산벚나무·올벚나무·왕벚나무가 있다. 합천 해인사의 고려 팔만대장경 60% 이상이 산벚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산벚나무는 산에 피는 벚꽃인데 진해 군항제가 끝날 때쯤 온 산마다 하얗게 핀다. 왕벚나무 벚꽃은 꽃이 먼저 피고 뒤에 잎이 나는데, 산벚나무는 잎과 꽃이 거의 동시에 핀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식재된 일본 벚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마뜩지 않지만, 꽃은 아무런 죄가 없다. 모든 나무가 그러하듯 벚나무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심어놓은 자리에 붙박이로 살아가며 철 따라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뿐이다. 벚꽃은 동시다발적으로 피어나 한꺼번에 져 내린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이미 꽃은 절정을 지나 꽃잎을 흩날린다. 벚꽃이 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지금껏 지고 온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 봄날의 낭만과 여유를 즐겨볼 일이다. 그리하면 후회로 점철된 어제와 무겁고 불편했던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꽃잎처럼 가벼워지고 팍팍하던 우리의 삶에도 물기가 돌고 벌떼 잉잉거리는 벚꽃처럼 넉넉해질 것이다.
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