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경제,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는 채권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채권을 판매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수익률 상승이 개발 도상국의 차입 비용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더 큰 위험은 미국 경제가 신흥 경제국보다 앞서서 주식과 채권의 유출과 통화 약세로 이어지리라는 것이다.
S&P 데이터에 따르면 18개 선진국 중 15개 국가의 리파이낸싱(부채 상환을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은 평균 차입원가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 S&P에 따르면 올해 국내 총생산의 38%에 해당하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이집트는 평균 11.8%보다 높은 평균 이자율 12.1%를 지불하고 있다. 가나는 평균 11.5%에 비해 크게 높은 15%를 지불한다.
위험은 높은 비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브라질은 올해 기존 부채의 평균 비용보다 적은 평균 4.7%로 리파이낸싱을 했지만, 과거보다 상환 기간이 매우 짧은 채권으로 발행했다. 작년에 새로운 부채의 평균 만기는 2019년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브라질은 올해 GDP의 13%에 해당하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는 작은 나라보다는 적은 비율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더 크며 금리 상승이나 예상보다 느린 경제 회복으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인 2.25~5.25%를 넘어섰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미 금리를 올해 두 번 인상했다. 이달 말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3월의 최저치인 2%에서 연말까지 5.5%를 예상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및 인도는 외국 금융기관보다 국내에 더 많이 의존한다. 따라서 과거의 부채 위기 때보다 자본 유출에 덜 취약하다. 특히 인도는 국가 은행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약 6%의 금리로 벤치마크 10년물 채권을 발행했다. 또한 올해 GDP의 3.3%에 해당하는 낮은 리파이낸싱으로 금리 인상에 덜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채권 만기는 짧아졌다.
식량과 상품 가격은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면서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고 성장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자본 흐름이 상호 연결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신흥 시장의 경우 벌써부터 통화 정책 압박이 오게 되면 경제 회복에 타격을 입는다. 신흥 시장이 이를 조정할 여지는 많지 않다는 우려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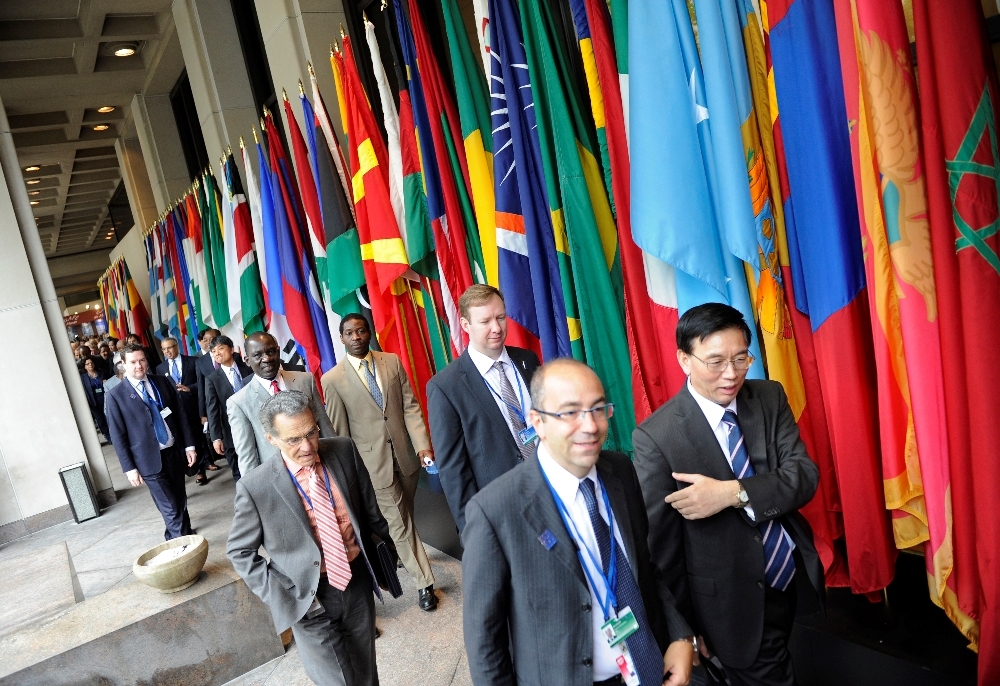





![[초점] 퇴보하는 ‘이민자의 나라’…美 반이민 정서 확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184&h=118&m=1&simg=2024042610582703413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