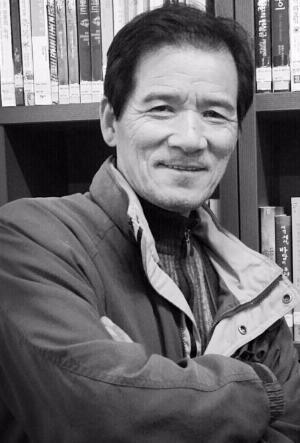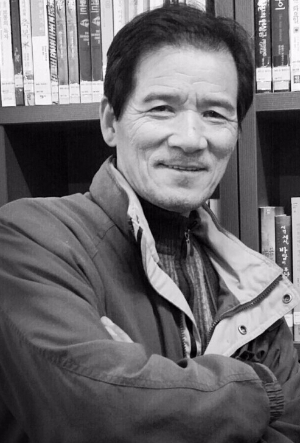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무더위에 핑계 대고 한껏 게으름을 피우다가 저녁나절 산책을 나섰다. 가로변에 심어 놓은 무궁화도 피기 시작했고, 아파트 화단엔 옥잠화와 비비추도 한창이다. 소공원의 나무 그늘엔 맥문동이, 작은 연못엔 수련과 부레옥잠, 노랑어리연도 피어 있다. 어느 집 손바닥만 한 꽃밭에서 마주친 상사화의 연분홍 꽃빛이 쉬 지워지지 않는다. 동네 한 바퀴 돌며 순례하듯 꽃들을 만나고 돌아온 저녁은 화사한 꽃빛이 눈에 어린 탓인지 푹푹 찌는 열대야도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
어여쁜 꽃들이 주는 기쁨만이 아니라 초록 그늘 드리워 우리를 편히 쉬게 하는 나무들의 고위로도 만만치 않다. 굳이 그늘이 아니더라도 수령이 오랜 큰 나무를 만나면 알 수 없는 경외감에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게 된다. 인간으로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긴 세월을 살아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숱한 풍상(風霜)을 겪어내면서도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 없이 철 따라 꽃 피우고 잎을 내며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나무들은 그곳이 어디이든 한 번 뿌리내리면 그 자리에서 생을 마친다.
자신이 겪어낸 세월을 몸속에 나이테로 기록하며 온갖 풍상을 온몸으로 다 받아 안으면서도 그 흔한 신음 한 번 낸 적 없는 나무의 생에 비하면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목숨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지 않은 생을 자신을 단련하고 알찬 생을 보내기보다는 남을 헐뜯고 시기하며 날 선 말들을 쏟아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인간(人間)이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사람’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땅에 발을 딛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며 사는 게 사람일진대 어찌하여 우리는 나무처럼 홀로 당당할 수 없는 것일까.
가마솥더위로 심신이 지쳐 가는데 갈수록 세상은 점점 흉흉하기만 하다. 짜증이 난다 싶으면 나는 가벼운 산책을 한다. 무작정 집을 나서 가까운 숲을 찾아가거나 동네 소공원을 산책하며 예쁜 꽃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독인다. 나무들이 마련해준 초록 그늘에 들어 그들이 들려주는 자연의 화음을 듣는다. 괜찮다, 괜찮다고 나를 위로하는 나무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