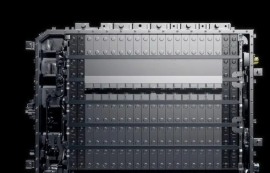8개사 순이익 작년比 23% 개선…‘불황형 흑자’ 달성
조달비용 부담 여전…사업비용 줄여가며 실적 방어
고객혜택 확대 어려워…올해 긴축경영 기조 이어질 듯
조달비용 부담 여전…사업비용 줄여가며 실적 방어
고객혜택 확대 어려워…올해 긴축경영 기조 이어질 듯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조달 재원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 카드는 단종시키고, 무이자 할부 등 주요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21일 여신업계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BC·우리카드 등 8개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7222억 원으로 작년 같은기간(5829억 원) 대비 23.88% 큰 폭으로 개선했다. 카드사별로 실적을 보면 신한·삼성·국민·하나·비씨카드 등 5개사의 실적이 개선했고, 현대·롯데·우리카드는 부진했다. 롯데카드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54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48억 원으로 54.3% 급감했고,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도 각각 36.2%, 8.9% 줄었다.
이번 카드사 실적을 두고, 너나 할 것 없이 ‘불황형 흑자’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영업환경이 개선됐다기보다는 사업비용 관리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우선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차입 등을 시도한 카드사들의 이자비용이 커졌다. 우리카드 이자비용은 지난해 1분기 812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100억 원으로 35.4% 늘었다. 롯데·현대카드 이자비용은 각각 30.5%와 28.3% 증가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판관비를 감축하며 비용을 효율화했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판매관리비가 1년 전보다 각각 9%, 4% 줄었다. 일반적으로 판관비엔 광고·마케팅비와 임직원 임금 등이 포함된다. 신한카드는 판관비가 4% 늘었으나 영업수익 증가율(12%)에 비해 크지 않다. 우리카드도 판관비가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카드이용 건수나 규모만 보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1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승인건수는 290조9000억 원·67억7000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6.2% 증가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파로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어 결제 증가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작년 말 기준 가맹점 수수료 수익 합계는 5조3500억 원으로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2%에 그친다. 2018년(30.5%)과 비교하면 6년 만에 7.3%포인트 줄었다.
이밖에 카드론 등 여신상품에 대한 대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카드사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카드사 연체율은 최근 2%를 돌파했고, 카드론 잔액은 40조 원을 넘어섰다. 카드사의 긴축경영에 소비자 혜택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했던 무이자 할부는 최근 3개월 축소됐고, 부분 무이자 혜택 역시 축소하는 추세다.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던 ‘알짜카드’도 대거 단종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개(BC카드 포함) 카드사에서 단종된 신용·체크카드는 458종으로 전년(116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