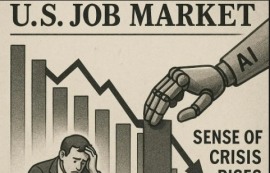연간 10조 정산자금 중 6조 금융권 이관…새 수익원 부상
위험등급 따라 수수료 천차만별…중소형사 고정비 부담↑
법조계 일각에선 신탁 운용수익 귀속 불확실 우려
위험등급 따라 수수료 천차만별…중소형사 고정비 부담↑
법조계 일각에선 신탁 운용수익 귀속 불확실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중은행과 서울보증이 연말 출시를 목표로 정산자금 외부관리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탁업을 보유한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수수료를 낮춰 PG사 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보증보험을 사실상 독점하는 서울보증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다.
PG사의 정산자금을 금융권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만큼, 수수료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수료율은 각 PG사의 신용위험·재무상태 평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은행과 보험사는 정산자금을 맡기기 전 PG사의 신용등급·자기자본·현금흐름·부실률 등을 종합해 위험등급을 매기는데, 이 등급이 높고 위험할수록 자본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더 높은 요율을 책정한다.
예를 들면 대형 PG사는 대규모 거래 규모와 안정적 현금흐름 덕분에 ‘양호’ 등급을 받아 신탁보수 0.1% 안팎, 보증보험료 0.5% 이하로 협상할 여지가 크다. 반면 중소형사는 매출 변동성이 크고 자본 여력이 부족해 ‘주의’ 등급을 받으면 신탁보수 0.3%, 보증보험료 0.7%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 이 격차는 정산 규모가 작을수록 더 치명적이다. 대형사는 수조 원 규모 정산자금에서 수수료율을 낮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지만, 중소형사는 수백억~수천억 원대 정산자금에 높은 요율이 적용돼 정액성 비용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마진이 거의 사라지는 구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탁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운용수익의 귀속 주체가 법령상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감독당국의 정책적 해석에 따라 언제든 ‘판매자 귀속’으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린은 보고서에서 “정산자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외부관리 중 발생하는 신탁수익은 PG사의 재무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명확한 규정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감독당국의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PG사의 수익구조가 급변하는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지만 현재 은행에 신탁을 맡기고 있는 선불업자들도 운용수익을 가져가고 있어 PG사도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라면서 “정산자금은 원래부터 판매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자금인 만큼 안전하게 보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뉴욕증시] AI 우려 진정 속 다우·S&P500↑](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10806275502909be84d876741182211201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