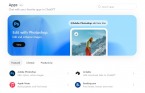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장기간 상환이 가능한 정부의 창업 정책자금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언제나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창업 정책자금에서 수혜의 햇볕이 들지 않는 소외지대로 ‘60대 이상’ 연령층이 꼽힌다.
최근 기자와 인터뷰했던 한 전통쌀국수 제조업체 대표는 제조·수입업에서 은퇴한 뒤 70세 고희(古稀)의 늦은 나이에 ‘쌀을 이용한 전통가공식품’이라는 신사업 아이템을 찾아 창업에 도전해 성공한 사례다.
정부에서는 신사업 발굴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위해 벤처 지원 명목으로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20~30대 청년층 창업에 집중돼 있고, 지원 업종도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의 아이템 위주이다.
초기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전통쌀국수업체 대표는 창업 과정에서 두 가지 편견에 시달렸다고 한다. 즉, '자금 회수가 염려가 되는 나이'와 '비인기 종목인 전통가공식품이 사업이 되겠냐'는 것이다. 정책 방향과 자금집행 부처의 두 가지 편견이 맞물리다 보니 담당 부처의 공무원들로선 ‘올드보이의 창업’이 반가울리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기관에서는 창업에 실패할 경우 자금회수 책임 때문에 무조건 호의적일 수만 없겠지만, 선진국처럼 창업 자금 대출시 사업의 아이템이나 잠재력을 보는 합리성은 제쳐두더라도 인기종목인 정보통신(IT) 업종에만 창업자금 지원을 몰아주는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청년창업을 통한 첨단기술의 발전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제대로 된 컨텐츠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은 '가장 한국적인 컨텐츠’에 있고, 동시에 100세 무병장수시대에 따른 고연령 노동인구 확대에 부합하는 창업지원정책이 한국경제의 건강성을 한층 더 높여준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이 적극 고려해 주길 바란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