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엔비디아는 지난 9월 Arm을 400억달러(약 47조원)에 인수했다.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려면 영국, 중국, 유럽 연합, 미국 등 주요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시장 독점을 꺼리는 중국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ARM이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로 넘어갈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접근을 제한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8년 설립된 ARM의 자회사 ARM차이나는 중국 자본이 51%, 해외 자본이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6월 ARM 영국 본사는 ARM차이나 최고경영자(CEO)인 앨런 우를 해고했다. 중국 정부가 ARM차이나를 국유화하고 기술 탈취를 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ARM차이나는 이에 불복하고 독자 경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사이먼 시거스(Simon Segars) ARM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승인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월 발표 당시 엔비디아는 최종 인수 완료까지 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거스 CEO는 "이제 두 달이 지났고 앞으로 승인절차를 마치기까지 1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 미래 혁신 센터의 지정학적 전문가 아비슈르 프라카시(Abishur Prakash)는 지난달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은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현지 칩 제조사들은 ARM이 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 불리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중국에 거래를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ARM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전세계 모바일 반도체의 95% 이상이 이 회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제조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애플과 퀄컴, 삼성전자, 화웨이 등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이 돈을 내고 ARM의 반도체 설계를 가져다가 쓴다.
ARM 창립자 중 한 명인 헤르만 하우저는 지난 8월 초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캠브리지, 영국, 유럽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또다른 창립자인 튜더 브라운 역시 "소프트뱅크의 ARM 매각 시도는 실패한 사업전략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상업장관은 "실리콘밸리 기업(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영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새로운 국가안보 및 투자 법안을 의회를 통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인수와 같은 기업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아직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새로운 법안에 따라 검토될 지 확인하지 않았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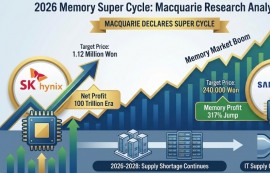





![[일본증시] 닛케이평균 반락 속 반도체·메모리주 급등...키옥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00107443406877fbbec65dfb2101781272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