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도시바는 지난 14일 쿠루마야 노부아키 사장이 퇴임하고 전 츠나가와 사토시 회장이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쿠루아먀 사장은 금융기관 출신이다. 자질은 차치하더라도 은행 출신으로 도시바와는 전혀 다른 업종의 인물이 도시바를 이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쿠루야마가 은행가로서는 우수했지만, 전문 분야가 다른 도시바에서 혁신을 일으켜 부활시킬 능력은 없었던 것 같다.
1999년 르노와 닛산의 자본 제휴가 이루어진 후, 르노의 카를로스 곤이 닛산의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취임했다. 그는 닛산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닛산 스스로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 곤 등장의 이유였지만 구고조정을 끝내고도 그가 닛산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실패였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직원들이 떠났는데 그 스스로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RJR 나비스코를 거쳐 1993년에 IBM 회장이 된 루이스 가스너는 ‘IBM의 구세주’ 소리를 들을 만큼 그의 임기 중 실적이 회복됐다. 그러나 그의 개혁에 의해 오랜 IBM의 전통인 종신고용이 무너졌다. 이것이 오늘날의 IBM 몰락의 근본 원인이다.
‘비용 절감’, ‘정리해고’ 등은 단순한 업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회사를 발전시키려면 회사의 잠재 능력, 숨은 장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외부에서 온 전문경영인이 하기 어렵다.
외부 인력은 어디까지나 위급할 때의 긴급 처방이다. 출혈이 멎은 후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 회사를 잘 아는 내부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 인수 때 그 회사의 주요 경영진이 남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버핏은 “우수한 경영자를 찾아내 머리를 갈아끼우는 재주는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평생 작은 섬유회사를 투자회사로 바꿔 시가총액 세계 톱10까지 오르게 한 버핏조차 회사 밖에서 전문경영인 또는 우수 인재를 초빙해 경영을 살린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이다.
버핏이 인수하는 기업의 상당수는 오너 회사이고 창사 이래 고초를 함께한 애착도 있어 경영에 힘이 실린다. 전문경영인 사장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회사 사정도 모른다. 차라리 내부 승진의 경우가 낫다는 지적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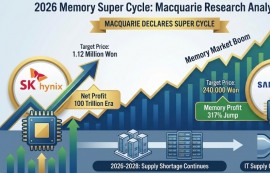





![[일본증시] 닛케이평균 반락 속 반도체·메모리주 급등...키옥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00107443406877fbbec65dfb2101781272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