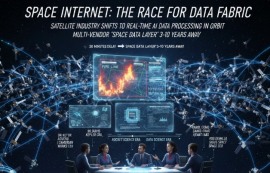인공지능 서버 대여 전문기업 코어위브 IPO 통해 드러난 8억 6300만 달러 감가상각
2024년 3억 2400만 달러 영업이익 기록
2024년 3억 2400만 달러 영업이익 기록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배런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AI 서버 전문 대여 기업 코어위브(CoreWeave)의 기업공개(IPO) 투자설명서를 분석,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이미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코어위브는 나스닥 시장에 'CRWV' 심볼로 상장을 준비 중인 AI 서버 대여 전문 기업이다.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하이퍼스케일러)과 달리 AI 서버 대여만을 전문으로 하는 순수 AI 기업이다.
코어위브는 2016년 암호화폐 채굴 회사로 출발했으나 2018년 비트코인 가격 폭락 이후 유휴 서버를 AI 컴퓨팅용으로 대여하는 사업 모델로 전환했다.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하면서 코어위브는 '적시적소'에 위치한 기업이 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연간 환산 실적을 보면 코어위브는 30억 달러(약 4조 3605억 원) 매출에 4억 5100만 달러(약 655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15억 달러(약 2조 1803억 원)에 달하는 감가상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거둔 성과다.
배런스는 "코어위브의 재무제표를 통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설비투자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며 "AI 클라우드에 투입되는 모든 자금이 높은 수요와 급격한 성장률 덕분에 빠르게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만 해도 클라우드 서비스 중 작은 부분이었던 AI 클라우드가 이제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배런스는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제공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코어위브의 자본 지출은 이미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서버와 네트워킹 장비 등 AI 인프라에 대해 4~6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코어위브는 지난해 8억 6300만 달러(약 1조 2544억 원)의 감가상각비를 통해 19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했다. 두 지표 모두 전년 대비 737%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 성장에는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배런스는 "2025년 설비투자가 감가상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에 따른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만약 2026년 어떤 이유로든 매출성장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영업이익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어위브의 IPO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배런스는 "AI 혁명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클라우드 사업이 이미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는 빅테크 투자자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코어위브는 엔비디아보다도 더 순수한 AI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어위브의 재무 정보 공개로 인해 기존에는 통합 재무제표에 가려져 있던 AI 클라우드 경제적 가치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를 통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과 수익 구조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