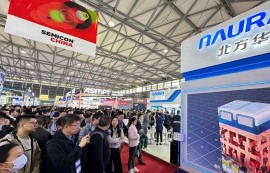안와르 총리 "8월 1일 관세율 발표 기대"… 러트닉 美 상무장관, 캄보디아·태국 합의 '언급'
말레이시아 25% 관세 위기, 필리핀·인니 19%, 베트남 20%… '경제 회복력' 강화 강조
말레이시아 25% 관세 위기, 필리핀·인니 19%, 베트남 20%… '경제 회복력' 강화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 발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이 국경 간 충돌을 끝내기 위해 휴전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미국이 캄보디아 및 태국과 관세 협정에 도달했다고 언급한 지 몇 시간 후에 나왔다.
안와르 총리는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으며, 이 통화에서 두 정상은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태국-캄보디아 분쟁 해결에 있어 말레이시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고 칭찬할 만한 역할을 해준 말레이시아에 최대한의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이전에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였지만, 이제 공식 발표는 1일에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다양한 결과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모두 미국과 19%의 관세율로 협정을 체결한 반면, 베트남은 20%의 관세율로 환적된 상품에 4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부 장관은 나중에 워싱턴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양국 정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자프룰 장관은 X(구 트위터)에 "우리는 이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후 미국 무역대표부와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합의된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갈등과 관세 협상의 해결을 중재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외교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는 무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로 저를 초대할 수 있고, 저는 토요일 하루 종일 듣고 그가 캄보디아와 태국에 전화를 걸고 있다. 월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휴전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가 뭘 했는지 아느냐? 우리는 캄보디아와 태국과 무역 협정을 맺었다"며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칭송했다.
상무장관은 또한 동남아시아 3개국 외에도 EU, 일본, 한국을 포함한 행정부의 다른 거래들을 강조했다.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동의했으며, 미국 제품은 면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태국 부총리 겸 재무장관 피차이 춘하바지라(Pichai Chunhavajira)는 미국이 관세율 발표 24시간 이내에 방콕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31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직 공식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24시간 이내에 미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태국은 "가장 강경하고 복잡한 협상 파트너" 중 하나로 간주되는 미국 측의 제안을 분석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쑨 찬톨 캄보디아 부총리는 러트닉 장관이 연설한 직후인 목요일 합의에 대해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간킴용(Gan Kim Yong) 통상부 장관은 화요일, 미국이 부문별 관세 양보에 동의하지 않고 10%의 기준 세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관세율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관리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무관세가 선호되지만 기준 세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 수 있고 여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29일 정책 연구소와 싱가포르 비즈니스 연맹이 주최한 회의에서 말했다.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가 정상회담을 주재할 예정이며,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인도, 유럽연합 정상들이 자주 참석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