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개 약속 중 상업 생산 단 10곳…목표 달성률 10%에 불과
고비용·기술 한계에 발목…항공사-석유업계 '책임 떠넘기기'
고비용·기술 한계에 발목…항공사-석유업계 '책임 떠넘기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세계 최초로 사업 규모의 SAF 생산에 성공했던 월드에너지의 패서마운트 정유 공장 폐쇄는 이 같은 현실을 상징한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16년부터 캘리포니아의 기존 정유시설을 바꿔 SAF를 생산하며 유나이티드 항공, 제트블루 등에 해마다 수백만 갤런을 공급해왔다. 2030년까지 SAF 10% 혼합 목표 달성의 핵심 생산기지 노릇을 했으나, 지난 4월 조용히 가동을 멈췄고 휴스턴 2공장 계획도 멈춰 섰다. 주요 협력사였던 에어 프로덕츠 역시 올해 초 확장 사업에서 철수했다.
월드에너지의 진 게볼리스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항공사들은 SAF 사업 약속을 과장하는 보도자료를 내놓는, 상당히 기만적인 활동에 관여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 말은 너무 많이 하고 행동은 너무 적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업계 현실을 지적했다.
◇ 165개 약속 중 상업 생산은 단 10곳
월드에너지의 실패는 빙산의 한 조각일 뿐이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12년간 항공사들이 발표한 전 세계 165개 SAF 사업을 분석한 데 따르면, 현실이 된 사업은 36개(22%)에 그쳤다. 이마저도 사업 규모로 SAF를 생산하는 곳은 단 10개(전체의 6%)뿐이었다. 23개는 아예 폐기됐으며, 27개는 지연되거나 무기한 보류 중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해마다 1180억 갤런의 SAF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생산량의 300배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현재 발표된 모든 사업이 최대치로 가동돼도 생산량은 120억 갤런에 그쳐 목표치의 10%를 채우는 데 머문다.
많은 항공사가 SAF 사용 확대를 선언하며 긍정적인 뜻을 보이지만, 실제 대규모 구매 약속이나 투자는 모자라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사들은 석유 업계가 충분한 SAF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IATA의 윌리 월시 사무총장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그들(석유 업계)이며, 이제 자신들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석유 업계는 비싼 가격 탓에 수요 자체가 없다고 맞선다. SAF 가격은 일반 항공유보다 3~5배 비싸다.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에너지스의 베르나르 피나텔 책임자는 "실제로는 생산 능력이 과잉인 것을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 '세계 최대' 프로젝트도 표류…곳곳서 '헛바퀴'
항공사들의 약속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뉴욕의 SGP 바이오에너지는 2022년 파나마에 세계 최대 SAF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생산 목표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뤄졌다. SGP의 랜디 러탱 CEO는 "항공사들이 연료 구매 약속에 진지한지 판단할 때까지만 SAF를 추진할 것"이라며, 차라리 선박용 재생 디젤 생산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개별 항공사의 사업 발표 경쟁을 지적하며 "여러 항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한계도 뚜렷하다. 현재 생산하는 SAF의 대부분은 폐식용유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하는 '수소처리 에스테르 및 지방산(HEFA)' 기술에 기댄다. 하지만 이 방식은 원료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대량 생산으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쓰레기나 폐목재를 원료로 하는 '피셔-트롭시' 같은 차세대 기술도 대안으로 나오지만, 영국 스타트업 벨로시스가 이끄는 사업을 포함해 아직 사업 생산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SAF 산업은 원료 확보의 어려움, 높은 생산비용,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더딘 기술 개발 등 여러 면에서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탄소배출 규제 압박으로 SAF 수요는 길게 보아 늘어날 전망이지만, 공급 확대와 사업 생산 안정화가 관건이다. 업계의 실질적인 협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과감한 유인책 강화와 연구개발(R&D)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밋빛 홍보와 달리 항공업계의 친환경 전환은 이륙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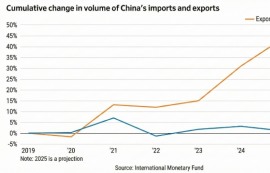

![[실리콘 디코드] 美 정보수장 "中 BGI, 화웨이보다 위험…인류 D...](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20708103801940fbbec65dfb1211312061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