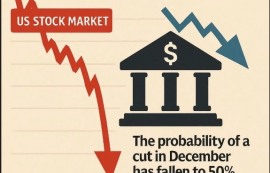하루 400만개 소포량 100만개로 급감…유럽·일본 등 미국행 배송 중단 속출
원산지 따라 관세율 최대 54%…판매자 미납 시 소비자에게 청구서 전가
원산지 따라 관세율 최대 54%…판매자 미납 시 소비자에게 청구서 전가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8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브루스 프랭글리는 스웨덴의 한 스포츠 브랜드에서 77달러짜리 셔츠 한 벌을 주문하고 배송비로 30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나 상품을 받은 지 2주 뒤, 그는 물류업체 페덱스한테서 42.35달러에 이르는 느닷없는 청구서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청구서는 다름 아닌 관세 부과금이었다.
프랭글리는 "같은 상품을 두 번 주문했는데, 한 번은 관세가 부과됐고 다른 한 번은 아니었다"며 "추가 관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이제는 해외 직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됐다"고 토로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800달러 면세'…국제 물류망 마비
이러한 혼란의 진원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수입 규정 변경이다. 미국은 기존에 '최소 기준(de minimis)' 규정에 따라 미화 800달러 이하 소포의 관세를 면제해왔으나, 지난 5월 중국발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우선 폐지한 데 이어 2025년 8월 29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으로 그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정책이 변경되자 그 여파는 즉각 수치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루 평균 400만 개에 이르던 800달러 이하 소포는 지난 5~6월 하루 평균 100만 개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심지어 전 세계 약 90곳의 해외 우체국에서는 미국행 소포 발송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특히 유럽, 일본, 호주, 대만 등에서의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페덱스, UPS, DHL 등 국제 특송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소포가 급증하면서 업무 부담이 커졌고,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판매자나 구매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 과정에서 따로 통관 대행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콜로라도주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앤서니 드수자의 사례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는 해마다 캐나다에서 약 640달러 상당의 오븐 부품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배송 전 UPS한테서 '정부 부과금' 1,196.12달러와 '통관 수수료' 128.17달러, 총액 1,300달러가 넘는 청구 이메일을 받았다. 상품 가격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 관세 등으로 부과된 셈이다.
드수자는 "처음에는 사기 이메일인 줄 알았다"며 "마치 20달러짜리 피자를 시켰는데, 이탈리아산 프로슈토 햄과 페루산 피망에 대한 관세라며 57달러를 추가로 내라는 격"이라고 황당함을 표했다. 그는 공급업체가 관세를 지불하기로 했음에도 온라인 결제 시스템 문제로 처리가 늦어지자, 결국 세 번째 배송 시도에서 상품 수령을 거부했다.
'깜깜이' 관세 구조가 혼란 키워…원산지·판매자 따라 '복불복'
해당 셔츠 판매사인 아크 스포츠 관계자는 "배송비, 세금, 추가 수수료 및 관세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웹사이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웹사이트 안내를 더 명확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기에는 소비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내 소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 생태계가 새로운 무역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이제 해외 직구 상품을 구매하기 전 관세 정보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을 심리 중이어서, 일부 소비자들은 관세 납부를 보류하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