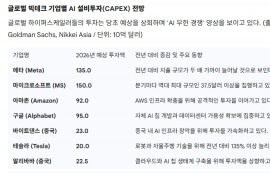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세계적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초부유층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세 체계가 소득과 소비에 집중돼 있어 자산가의 부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억만장자들의 국경 간 이동성까지 겹쳐 과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부의 폭발적 증가와 낮은 실효세율
FT에 따르면 지난 1987년 첫 글로벌 억만장자 명단에 오른 인물은 140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3000명을 넘어섰다. 총자산은 16조 달러(약 2경1800조 원)에 달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개인 자산만 3420억 달러(약 467조 원)로 1987년 억만장자 전체 자산 총액(2950억 달러)을 웃돈다.
◇ 부유세의 역사와 한계
1980년대 중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절반이 순자산세를 운영했으나 현재 유럽에서 이를 유지하는 나라는 스페인·노르웨이·스위스뿐이다. 자산가들의 국외 이주와 회피 수단으로 세수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일정 금액을 일괄 납부하는 ‘포르페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상속세 신설 논의로 일부 부자들이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르페 제도는 부유한 외국인에게 “정액 과세 패키지”를 제공하는 스위스식 세금 협상 제도다.
노르웨이에서는 최근 총선에서 자산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영국은 비거주 제도 개편 이후 일부 부호들이 이탈했다. 반대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이탈리아는 세제 혜택을 내세워 부유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 글로벌 세제 경쟁과 정치적 딜레마
파스칼 생타만 전 OECD 조세국장은 “부자들의 충성은 조국이 아니라 돈에 있다”며 각국의 과세 한계를 꼬집었다. 각국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 압박 속에서 초부유층 과세를 유혹적으로 바라보지만 부자들이 이탈할 경우 오히려 세수와 투자, 기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FT는 전했다.
◇ 복잡한 해법…개혁 압박은 지속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유세 도입보다 기존 부동산세·상속세·양도소득세 개혁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 속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라는 정치적·도덕적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FT는 “100년 뒤 역사가들은 ‘몇몇 개인들이 수백억 달러를 쥐도록 방치한 것은 광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초부유층의 자산 집중이 결국 포퓰리즘을 자극할 위험을 경고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