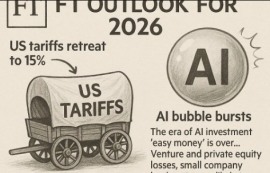엔비디아 최신 GPU 10만대 5년간 확보…AI 서비스 개발 가속
자체 데이터센터 증설·외부 임대 병행…AI 인프라 '투트랙' 전략
자체 데이터센터 증설·외부 임대 병행…AI 인프라 '투트랙' 전략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디지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신흥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오클라우드' 제공업체 네비우스(Nebius)와 194억 달러(약 27조 3100억 원) 규모의 파트너십를 맺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네비우스를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10만 개 이상을 5년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MS는 네비우스가 미국 뉴저지주 바이닐랜드에 새로 짓는 데이터센터에 설치할 엔비디아의 'B300' GPU 72개를 탑재한 'GB300' 서버 랙 약 1400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한다. 이는 총 200억 달러(약 28조 원)에 가까운 가치를 지닌 막대한 규모의 컴퓨팅 용량이다.
MS가 이처럼 외부 자원 확보에 나선 까닭은 자사 데이터센터 자원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어시스턴트, 코파일럿 유형의 서비스 등 개발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외부 전문기업의 자원을 활용해 AI 서비스 배포를 가속하고, 내부 역량은 핵심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효율 높은 이원화 전략을 채택한 셈이다. 네비우스는 러시아 IT 기업 얀덱스(Yandex)의 국제사업 부문이 분사해 지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세운 AI 기반시설 전문기업이다.
AI 시대 신흥 강자 '네오클라우드'와 맞손
이번 계약은 AI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네오클라우드'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네오클라우드는 AI 모델의 훈련과 추론에 특화한 고성능 GPU 컴퓨팅 자원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신흥 클라우드 기업을 일컫는다. MS는 네비우스뿐만 아니라 이미 코어위브(CoreWeave), 엔스케일(Nscale), 램다(Lambda) 등 여러 네오클라우드 기업에 130억 달러(약 18조 원)가 넘는 자금을 투자하며 AI 기반시설 생태계를 넓혀왔다.
대표 격인 코어위브는 본래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었으나 AI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 빠르게 사업 방향을 바꿔 현재 오픈AI와 주요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이 회사는 60억 달러(약 8조 원)를 투자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100MW(메가와트)급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S의 이러한 광폭 투자는 챗GPT와 깃허브 코파일럿 같은 자사 AI 서비스가 막대한 사용자 이용량을 일으키며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필연의 선택이다.
내부 증설·외부 임대 병행…공급망 재편하는 '이중 전략'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콧 거스리 클라우드 부문 책임자는 "AI 서비스 확장에서 병목 현상을 피하려면 풍부한 컴퓨팅 용량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네오클라우드 제공업체의 기반시설을 빌리는 방식은 GPU와 전력 자원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세계 시장 확장 노력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큰 수단이다. MS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나 알파벳(구글) 같은 경쟁사에 비해 사용자 기반이 훨씬 방대해 AI 컴퓨팅 수요 역시 더욱 절실하다.
물론 MS는 외부 동반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자체 데이터센터 투자도 꾸준히 함께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위스콘신주 마운트플레전트에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와 독립 전력 체계를 갖춘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한 것이 그 증거다.
시장 분석가들은 외부 자원 확보와 내부 기반시설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MS의 '이중 전략'을 높이 평가한다. 급변하는 AI 시장의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막대한 설비투자에 따르는 자본 지출(CAPEX) 일부를 운영 비용(OPEX)으로 바꿔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뉴욕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2025년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10106433108114c35228d2f51751931501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