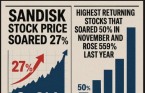"러시아만 파트너"…서방과 단절 속 '유령 공장' 속출
디지털 편의는 '감시의 덫', 화려한 도시 이면엔 빈부격차
디지털 편의는 '감시의 덫', 화려한 도시 이면엔 빈부격차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선전에서 최근 열린 한 국제 반도체 전시회는 중국의 현실을 압축해 보여주는 무대였다. 전시장은 반도체 국산화를 이루려는 국가 의지와 열기로 가득했다. 국제 공급망 압박과 폭발하는 내수 시장이 맞물리면서 중국 반도체 업계는 생존을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수출길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하지만 전시장을 가득 메운 열기 속에서 이질적인 풍경이 드러났다. 외국인 참석자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현장의 한 중국인 참가자는 "이제 우리의 주요 국제 파트너는 러시아·벨라루스 등 '북방 동맹권'에서 온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서방의 첨단기술 제재가 만든 고립의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유령 공장' 속출…보조금의 역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기술 쾌거를 선전하지만, 현지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중국과 대만 반도체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대화에서 "정부 발표는 완전히 거짓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과장됐다"고 입을 모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링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약 980억 달러(약 139조 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민간 독립 투자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중국집적회로대기금(IC Big Fund)'과 같은 국가 펀드의 직접 자금이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막대한 투자 비용을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구조의 취약함을 드러낸다. 보조금은 영원할 수 없으며, 급격한 정책 변화는 산업을 곧바로 불안정하게 만든다. 실제로 제도를 악용해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핵심 기술에 이르기도 전에 사업을 중단하는 '유령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 안에서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28곳 가운데 실제 웨이퍼를 투입하는 공장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내부 경쟁이 더 강하고, 기술이 뛰어난 기업을 탄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현지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경쟁 구도가 기술 축적보다는 단기 양산과 빠른 수익 회수에만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2025년 상반기 반도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9.2% 늘었지만, 산업 전체 수익성은 오히려 2% 줄어 '양은 늘고 질은 떨어지는 괴리'를 명확히 보여줬다. 낮은 수율 같은 근본 문제는 가리고, 겉모습만 부풀리는 착시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중국 본토 기업과 대만 기업 모두 "완전한 반도체 자급자족은 여전히 멀었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KDI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내세운 2025년 자급률 목표 70%와 달리 실제 달성률은 약 35~40%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핵심 기술 공백은 여전히 대만의 전문 인력과 기술이 메우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편리함의 덫, 감시 사회의 그늘
위챗과 알리페이 없이는 음식 주문, 쇼핑, 대중교통 이용 같은 기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현실은 '편리함의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누리기 위해 사용자들은 계정 연동,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내줘야만 한다. 이는 실질적인 편리함보다 감시와 정보 통제를 강화하며, 경제 침체 속 '생존형 플랫폼 의존 경제'를 굳어지게 한다. 모든 동선과 정보가 거대 플랫폼의 감시망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트루먼 쇼' 같은 삶이다. 사생활이 곧 사회생활을 위한 비용이 됐다.
중국 최고 도시로 꼽히는 선전의 화려함 이면에는 깊은 골이 파여 있다. 도심에서 지하철로 30분만 가면 마주하는 극심한 빈부격차는 기술 굴기라는 거대 담론이 가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지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보여주기식 성과'와 '실제 삶'의 괴리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중국의 기술 야망이 마주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성취보다는 환상에, 해방보다는 통제에 가까운 기술 발전의 민낯이자 지속가능성 대신 보조금으로 쌓아 올린 '구조적 신기루(silicon illusion)'의 현실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특징주] 삼성전자, 4분기 깜짝 실적 발표...차익 매물에 주가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10817161202382edf69f862c6177391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