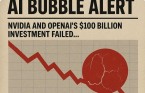태양광·전기차 등 ‘신세 산업’ 2025년 2.1조 달러 생산… 브라질 GDP와 맞먹어
청정 에너지 투자액 1조 달러 돌파… 화석 연료 투자의 4배에 달해
청정 에너지 투자액 1조 달러 돌파… 화석 연료 투자의 4배에 달해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 이상이 이 산업에서 창출되었으며, 청정 에너지 부문 하나만 떼어놓고 봐도 세계 8위 경제 대국인 브라질이나 캐나다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6년 2월 5일(현지시각) 청정 대기 연구센터(CR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청정 에너지 산업은 역대 최대인 15.4조 위안(미화 약 2.1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는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1.4%에 해당하는 수치다.
◇ 청정 에너지 없었다면 5% 성장률 달성 불가능
보고서는 2025년 중국이 달성한 약 5.0%의 GDP 성장률 중 청정 에너지 산업의 기여도가 절대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청정 에너지 부문이 없었다면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3.5%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청정 에너지가 전체 성장의 약 30% 이상을 책임진 셈이다.
청정 에너지 부문의 연간 성장률은 2024년 12%에서 2025년 18%로 가속화되었으며, 2022년 이후 실질 경제 가치는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지난해 중국 내 전체 투자 증가분의 90% 이상이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 화석 연료 압도하는 ‘1조 달러’ 투자… ‘신세 산업’이 주도
중국의 투자는 이제 석탄과 석유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2025년 청정 에너지 투자액은 7.2조 위안(미화 약 1조 달러)에 달했다. 이는 화석 연료 채굴 및 석탄 발전에 할당된 2600억 달러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 2026년 ‘태양광, 석탄 추월’ 예고… 그러나 과잉 생산 우려도
중국전력위원회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은 설치 용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이 석탄을 제치고 중국 제1의 전력원이 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격한 팽창에 따른 부작용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2026년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이 약 180~240GW로, 지난해 기록적인 315GW에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격화되는 가격 전쟁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산업 내 ‘과잉 생산 능력’ 및 해외 국가들과의 무역 마찰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더라도, 실적과 성장이 필요한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들의 목표치가 여전히 높아 당분간 높은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 일론 머스크 “중국, AI 전력 병목 현상에서 자유로울 것”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다보스 포럼에서 “AI 대중화의 가장 큰 제약은 전력이 될 것이며, 전 세계가 칩은 많아도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덧붙이며, 중국의 압도적인 재생 에너지 발전 역량이 미래 기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중국 전체 설치 발전 용량의 60% 이상을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며, 중국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거대한 베팅을 이어가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