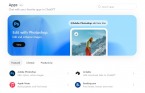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갈등은 첨예하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외 콘텐츠 기업(CP)들의 고용량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망 관리 비용으로는 사업을 운영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망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만큼 CP들도 망 사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넷플릭스가 미국, 프랑스 등 타국 ISP와 망 이용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한다.
넷플릭스는 이를 반박한다. 이미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ISP에 매월 요금을 내면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를 구매했는데, CP에게 망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중복 과금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어떤 다른 기업과 ‘망 사용료’를 명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며 자사 서비스로 인한 트래픽 과부하 문제는 캐시서버 무상 설치 프로그램(OCA)으로 해결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건 ‘망 사용료’라는 애매한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망 사용료는 말 그대로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이다. 그러나 청구 항목과 규모는 기업 간 계약마다 다르고 기밀 조항이다.
더 나아가 국내 CP와 국외 CP의 ‘망 사용료’는 성격이 다르다. 국내 인터넷에 접속해 서비스를 개시해야 하는 국내 CP는 ISP에 접속료가 포함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역시 본국의 ISP에 서비스 개시를 위한 접속료를 지불한다. 국내 ISP에 이용 대가를 낸다면, 그건 연결 비용 정도다. 그런데도 왜 업계에서는 이를 ‘망 사용료’라고만 부르는 걸까. 여러 개념이 뭉뚱그려진 용어를 사용하니 국내 CP와 국외 CP와의 역차별 논란은 실제보다 강조됐고, 넷플릭스의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한 적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었다.
글로벌 CP들의 막대한 파워로 오히려 국내 ISP가 열위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SK브로드밴드와 같은 ISP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을 감내하기 위해 망 투자를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수익보단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시장 변화를 고려하면, 대형 CP들에 인터넷 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장 지배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갑 중의 갑’인 글로벌 CP들과 제대로 협상하기 위해 ISP가 이들에 청구할 비용은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혔다면 어땠을까.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