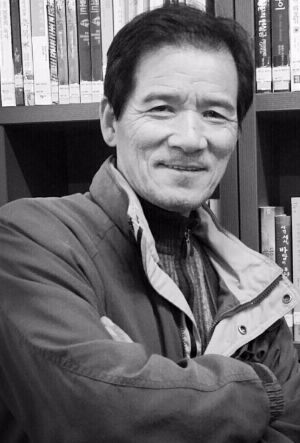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나는 숲을 거닐며 봄을 느낀다. 뺨을 스치는 바람결에서, 바람에 쓸리는 우듬지의 잔가지에서 겨울을 견딘 맥문동의 초록 잎에서, 바위를 덮고 있는 이끼의 푸른 빛에서, 나무 사이로 비껴드는 은빛 햇살에서 서서히 일어서고 있는 봄을 감지한다. 얼핏 보면 낙엽에 덮여 겨울잠에 취한 듯 보이는 숲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새싹의 기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바람의 치마폭을 잡고 일어서는 그 여린 새싹들이 마른 숲에 생명의 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天下之至柔(천하지지유) 馳騁天下之至堅(치빙천하지지견)이라 하여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했다. 형체도 힘도 없는 물이지만 단단한 흙덩이를 듬뿍 적시면 그 흙은 스스로 무너지고, 단단한 바위 틈새로 물이 스며들면 바위도 마침내 부서지고 만다. 아래로 흐르면서 만물을 적시는 물이 지닌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이치다.
꽃을 찾는 사람들은 벌써 산으로, 들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 쫓기어 봄이 오는지 겨울이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마주친 꽃을 보고는 봄이 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있다.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말이다. 삶이 고단해지면 오고 가는 계절에 둔감해지기 쉽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이지만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으면 설레는 봄을 맞이할 수 없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크게 한 번 기지개를 켜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 안에 봄을 세워야겠다.
동의보감에서는 봄이 되면 자연에서는 생기가 일어나고 만물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뜰을 여유롭게 거닐며 머리는 꽉 묶지 말고 느슨하게 풀고 몸을 이완하여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게 봄기운에 상응하는 양생법이라고 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데 힘쓰고 죽이지 않으며 베풀되 빼앗지 않고, 벌 대신 상을 주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 해도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살피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올봄에는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봄‘이라 말만 해도 어딘가에 꽃이 피어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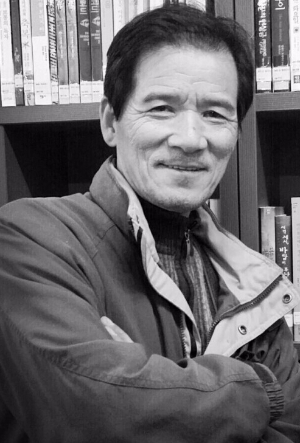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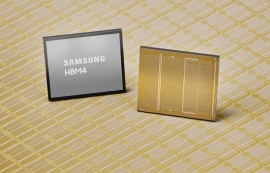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