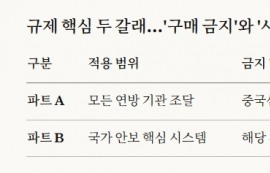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1934년생인 슈발리에 이사는 뱅크오브뉴욕(Bank of New York) 부회장을 맡는 등 미국 뉴욕 금융시장에서 40년 넘는 경력을 쌓은 은행가다. 외국인 지분율이 최고 60%대에 이르렀던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이들을 대표해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냈다.
슈발리에 이사는 포스코 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구택 회장이 2006년 도입한 ‘CEO(최고경영자)-이사회 분리안’(이하 분리안)이다. 포스코는 2004년부터 분리안을 마련했지만, 외부 인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 포스코 경영에 간여해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이 회장은 사내외에서 보이는 불안감을 불식하려고 2년여 시간을 들인 끝에 관철했는데, 그를 측면 지원한 사람이 슈발리에 이사였다. 이사회 때 안건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내는 의견이 찬성‧반대 의견을 넘어 경영진에 경영 지도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럴 때마다 슈발리에 이사는 “사외이사는 경영진 방침에 찬반 의견을 내놓을 순 있어도 이래라저래라 하는 식의 경영 간여를 해선 안 된다. 그것은 사외이사 권한 밖의 일”이라며 중심을 잡아줬다는 것이다. 덕분에 포스코 이사회는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에 합리적인 토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분리안은 안착했다.
그런데 실제 속내는 달랐나 보다. 이 회장이 슈발리에 이사를 힘겨워하며 “사외이사(슈발리에 이사)를 교체할 수 없나?”라고 털어놓은 일이 더 많았단다. 워낙 원칙에 입각한 사람이다 보니 경영 안건 하나하나마다 제동을 거는 슈발리에 이사를 설득하기 위해 이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가야 했던 일이 수차례였고, 그러다 보니 사외이사에 흔들려 미치겠다는 하소연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결국 안건은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대화와 논의가 수반됐다. 슈발리에 이사가 “포스코 경영진과 갈등을 빚지 않은 사외이사”라는 평가와는 완전 배치된다. ‘경영에 간여하지 않되, 성가실 정도로 반론을 제기해 최고의 방안 도출을 유도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슈발리에 이사는 실천했다.
2003년 초, 포스코는 유상부 당시 회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정부 측 우호 지분의 반대로 갈등이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해 2월 뉴욕에서 취재진을 만난 슈발리에 이사는 “경영 성과를 종합했을 때 유 회장 연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 측의 유 회장 연임 반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CEO 능력은 경영 성과로만 평가하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자, 민간기업인 포스코 CEO 선임에 경영 외적 요소가 개입하는 한국의 풍토를 묵인할 수 없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을 대변한 발언이었다.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에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이 추대됐다. 20여년 전과 같이 이번 선출 과정에서도 사외이사의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근거 없는 루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나온 과정을 보면 그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하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원칙에 입각해 소신을 밀어붙여 경영진을 힘들게 하는 사외이사를 등용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슈발리에 같은 외국인이라도 반드시 초빙해야 한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