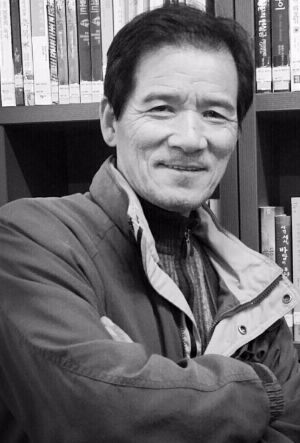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천변에는 쇠백로가 먹이 사냥을 하고 몇 마리의 물오리들이 한가롭게 자맥질을 하며 노는 모습이 평화롭기만 하다. 어느새 축대 사이로 돋아난 새싹들이 푸릇푸릇하고 마른 풀섶 위로 솟아오른 풀빛이 눈을 찌른다. 딱히 꽃을 보지 않아도 봄이 오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땅바닥에 바짝 달라붙어서 혹독한 겨울을 난 로제트 식물들이 서서히 키를 키우고, 흐르는 냇물 속에도 물고기들이 활달하게 오고 간다. 천변의 모래톱엔 몇 마리의 새들이 엷은 봄볕을 쬐고 있다. 수중보 근처엔 일군의 민물가마우지가 젖은 깃을 말리느라 날개를 펼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좀 더 가까이에서 새들을 찍어볼 요량으로 둑을 내려가다가 흰 냉이꽃과 노란 꽃다지를 보았다. 나를 꽃의 세계로 이끌어준 냉이꽃은 볼 때마다 작은 설렘으로 다가온다. 사람이 가장 고단했던 시절, 배밭 과수원에서 지면을 가득 메우고 하얗게 무리 지어 피어 있던 꽃이 바로 냉이꽃이었다. 그 이전에도 수없이 보았던 냉이꽃이었는데도 그날따라 새로운 감동이 밀려와 한동안 꼼짝할 수가 없었다. 비단 꽃만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느 한순간 반짝이는 빛나는 존재가 된다. 작은 꽃일수록 무리 지어 피어야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마련이지만 꽃이 귀한 요즘엔 그 작은 꽃 하나도 반갑고 예쁘기만 하다. 흰빛의 냉이꽃보다는 노란 꽃다지가 더 마음을 끌어당기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꽃다지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양지바른 들이나 산에서 핀다. 꽃대마다 작은 꽃들이 정말 '닥지닥지' 붙어서 피는데, 그로 인해 '꽃다지'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얼핏 보면 흰색 냉이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과 열매 모양이 확연히 다르다. 냉이와 함께 무쳐 먹기도 하고, 향긋한 맛이 나 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꽃다지와 소리가 비슷하고 오밀조밀 작은 꽃 모양으로 인해 '코딱지나물'이라는 별로 예쁘지 않은 별명도 지니고 있다. 풀꽃 이름이 아닌 '꽃다지'는 오이·가지·참외·호박 따위에서 맨 처음에 열린 열매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때는 꽃을 닫아야 열매가 맺히니 그리 불릴 만도 하다. 안도현 시인은 ‘소풍길’이란 시에서 “따라오지 마라 했는데도/ 끝까지 따라오는/ 요놈, 꽃다지/또, 꽃다지”라고 노래했다. 그만큼 꽃다지는 봄날 어딜 가나 쉽게 마주치는 꽃이다. 그래서 봄날의 소풍 길은 어디나 꽃길일 수밖에 없다.
꽃을 찾아 풀섶을 오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린 새싹들을 밟을 때가 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풀섶을 벗어날 때쯤엔 신발에 풀물이 들어 있기 십상이다. 사람들의 발에 수없이 밟히면서도 여전히 의연하게 다시 일어서 마침내 무성해지는 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싶어진다. 바람에 날린 씨가 떨어진 곳이 길 위라 해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자신의 몫을 묵묵히 수행한다. 사람들의 발길에 무수히 짓밟히면서도 기어코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노란 꽃다지 꽃을 생각하는 아침, 내 안에도 봄빛이 일렁인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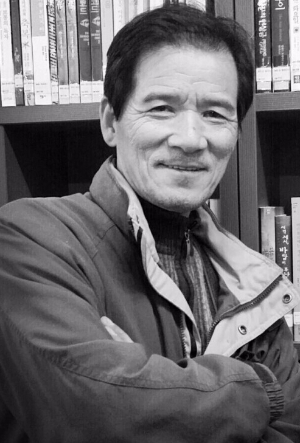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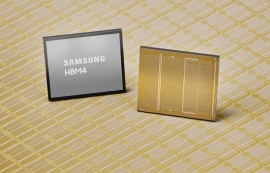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