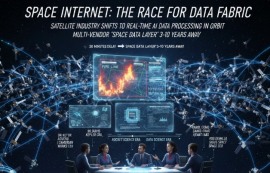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마오는 1956년 농촌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마침 참새가 벼를 쪼아 먹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당시 중국은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다. 먹을거리가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연이은 흉작으로 고민하던 마오는 현지에서 "참새는 해로운 새"라고 한마디 내뱉었다. 중국어로는 이른바 "麻雀是害鸟"이다.
마오의 발언 직후 중국 공산당은 전국농업발전강요(全國農業發展綱要)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농업발전을 위한 정강을 발표한다. 이 정강 지침 제27항이 그 유명한 제사해(除四害) 조항이다.
제사해란 4가지 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해는 중국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4가지 해로운 해충이다. 모기(蚊子), 파리(苍蝇), 쥐(老鼠) 그리고 참새(麻雀)다. 이를 박멸하자는 것이 바로 제사해 운동이다. 중국어로는 除四害运动이다. 그중 참새를 잡는 활동은 타마작운동(打麻雀运动)이라고 한다.
마오쩌둥의 한마디로부터 비롯된 타마작운동은 말 그대로 중국 정부와 지식층은 물론 모든 인민이 동원됐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참새가 농작물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농촌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거리로 나가 참새들을 한시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말 그대로 나는 새를 탈진시켰다. 중국 곳곳에서는 잡은 참새를 달구지에 매달고 거리에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 이어졌다.
중국 공산당은 대륙의 전 인민을 동원해 해충잡이에 나섰다. 모기, 파리, 쥐, 참새 중에서도 마오가 직접 거명한 참새를 집중적으로 제거했다. 한 해 동안 무려 2억5000만 마리를 잡아 죽였다. 마오쩌둥과 당 지도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곡식 사이사이에 해충이 못 들어가도록 다닥다닥 모여서 씨를 뿌리라고 지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충의 번식을 가속화했다.
참새만 사라지면 농사가 흥할 거라는 정부와 농민들의 기대와 달리 황충을 비롯한 참새에게 잡아먹히던 해충들의 개체수가 조절되지 못해 해충이 막대한 규모로 발생했다. 엄청난 흉작 사태가 터졌다. 일본뇌염, 뎅기열, 황열, 웨스트나일열, 말라리아, 이질, 장티푸스, 살모넬라, 콜레라 등의 각종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던 모기와 파리도 포식자인 참새가 없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번식해 전염병을 대규모로 퍼뜨렸다.
식량 생산량은 크게 낮아지고 질병 대란이 왔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참새가 없어지면서 각종 해충이 창궐했다. 대흉년이 이어지면서 무려 4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참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마오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 무의미하고 단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참새 도살이 야기한 참극이다. 다급해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소련 서기장인 니키타 흐루쇼프에게 빌어 연해주에서 20만 마리의 참새를 공수하기에 이른다.
참새가 추수기에 곡식을 훔쳐 먹는 해로운 새인 것은 맞다. 참새는 추수기가 아닌 평소에는 농작물과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각종 곤충과 벌레들을 훨씬 더 많이 잡아먹고 사는 이로운 새이기도 하다. 참새의 감소로 늘어난 곤충과 벌레를 인간이 제거하지 못하면서 대흉년이 야기됐던 것이다. 농경지 부근의 생태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실시한 초대형 오판이자 국가급 소탐대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독재자의 즉흥적인 말 몇 마디와 인사고과에만 혈안이 된 공무원들에 의해 실행되고 철회됐다는 점에 있다. 당시 중국공산당 전반에 만연해 있던 '실적주의'와 '서류상 데이터'에 치중된 정책 입안은 하위 간부들을 보여주기식 정책과 서류 숫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맹목적 보여주기는 무분별한 참새 학살과 병충해 창궐이라는 최악의 결과만 낳았다.
대약진운동(大跃进运动)도 마찬가지다. 대약진운동이란 공산혁명 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1958년부터 1961년말·1962년초까지 마오쩌둥의 주도로 시작된 농공업의 대증산 정책이다. 중국은 대약진운동의 기치 아래 인민공사를 창설하고 철강사업과 같은 노동력 집중 산업을 독려하는 대중적 경제부흥운동을 추진했다.
'대약진'이라는 말은 인민일보의 1957년 11월 13일자 시론인 "전 인민을 발동하여 40조 강요를 토론하고 농업생산의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자"에서 유래했다. 마오쩌둥은 7년 안에 영국을, 8년 혹은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업생산의 지표를 높였다. 이를 위해 농촌에서 과도한 인력을 강제로 차출했다. 그 과정에서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필수품의 공급부족이 일어났다. 노동력을 잃은 농촌의 농업생산력은 급격히 저하되어 농업경제의 파탄을 가져왔다.
농업생산량 부족에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과 소련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경제원조 중단이 계속되자 수천만 명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했다. 기술개발을 병행하지 않은 노동력 집중만으로 과다하게 부흥시킨 중화학공업은 처음 설정한 경제지표에 못 미치는 성장 결과를 보이면서 대약진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 결과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가주석 자리를 사임했다. 3년여 동안의 대약진운동은 중국을 발전시키기보다는 농·경공업의 퇴보와 중화학공업의 과다 발전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으며 중국 전체의 경제적·문화적 수준을 20년 이상 퇴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집단농장화나 농촌에서의 원시적인 철강 생산 등을 진행시킨 결과 2500만 명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아사자를 내고 큰 실패로 끝이 난다. 마오는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진 해외직구 금지 소동을 보면서 중국의 참새 박멸과 대약진운동의 교훈을 되새기게 된다. 정부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제품 직접구매에 제한을 두려던 계획을 결국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정책 혼선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성 실장은 이어 “정책발표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해 직구를 차단하자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의로 출발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야기될 국민들의 불편과 소비선택권 차단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해외직구를 찾게 되는 근본 원인은 국내 유통산업의 독점과 낙후로 가격이 너무 비싸고 선택 폭이 적다는 데 있다.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착한 의도가 곧 착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참새 박멸 운동처럼 재앙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경제정책의 과학적 추진이 필요한 이유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겸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