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문으로 읽는 21세기 도덕경' 제38장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성인의 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므로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골짜기 물처럼 무위로 베풀므로 위대하다. 그러므로 덕을 입은 상대방은 저절로 성인을 따르고 존중으로 응답한다.
덕이 있고 없음에 대해 노자의 말은 이러하다.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기에 덕이 있고, 최하의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므로 덕이 없다. 가장 훌륭한 덕은 베풀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베풀어지므로 덕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최하의 덕은 베풀기 위해서 베풀므로 덕이 있어 보인다. 무위로 베푸는 진실한 덕은 소리도 없고 소문도 없으며 베푼다는 기미조차 없다. 그러므로 베풀어도 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데다 아예 덕이 없어 보인다.
물이 숲을 길러주지만 기미조차 없어서 덕이 없어 보이고, 덕이 없어 보이니 덕이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 성인의 덕이 그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상의 덕에 대해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설파했다.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함으로써 무위의 복덕이 한량없음을 부연했다.
최상의 덕은 덕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을 하므로 덕이 있고, 최하의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므로 덕이 없다. 최상의 덕은 무위로 하므로 덕이 없어 보이고, 최하의 덕은 베풀기 위해서 베풀므로 덕이 있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최상의 어짊은 무위로 어질므로 어질지 않아 보이고, 최상의 의로움은 무위로 의로우므로 의롭지 않아 보이고, 최상의 예는 예가 없어지고 나서야 바른 예가 응한다.
비유하면 소매를 걷어 올려 힘을 주면 팔꿈치가 저절로 움직여 손이 따라 움직이듯 저절로 어질고 저절로 의와 예가 응한다. 그러므로 도를 잃고 난 뒤에야 덕이 있고, 덕을 잃고 난 뒤에야 어짊이 있고, 어짊을 잃고 난 뒤에야 의로움이 있으며, 의로움을 잃고 난 뒤에야 예가 있으니, 무릇 예에 의해 진심과 믿음이 얕아질 수 있거니와 어지러움의 시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仁)·의(義)·예(禮)를 앎은 도의 꽃이지만 우매함의 시작이기도 하다. 모름지기 대장부는 무위에 대한 믿음이 두터워야지 얕아서는 안 된다. 진실(眞實·도의 열매 무위)에 마음을 두어야지 꽃(華·유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저것(知識·유위)을 버리고 이것(無爲·저절로 위해짐)을 취해야 한다.
인·의·예·덕(德)을 지식으로 통달하면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화려한 꽃같이 한다. 하지만 꽃은 오래지 않아 아름다움과 향기를 잃고 땅에 떨어져 사라진다. 따라서 열매를 취해야지 꽃을 취해서는 안 된다. 꽃은 도의 화려한 허상이기 때문이다. 인·의·예·덕을 무위로 행하는 진정한 군자는 언제나 새싹을 틔우는 열매처럼 영원히 그 자취가 사라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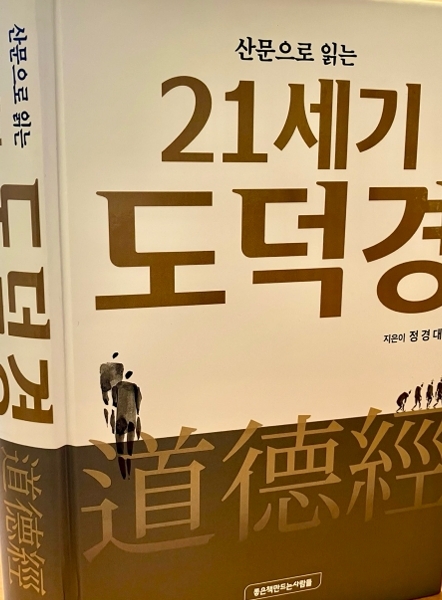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경대 한국의명학회 회장(종교·역사·철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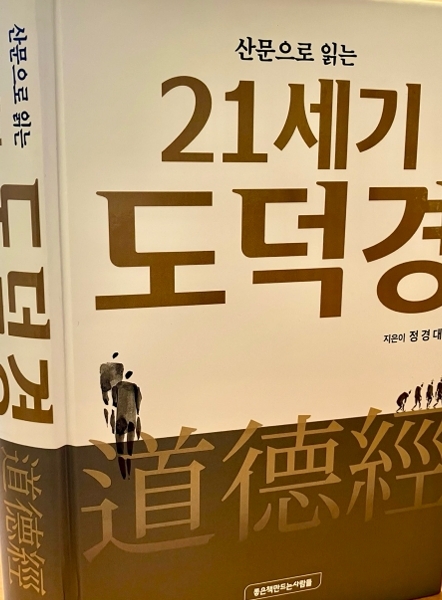





![[뉴욕증시] FOMC 의사록·물가지표에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1504005307100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