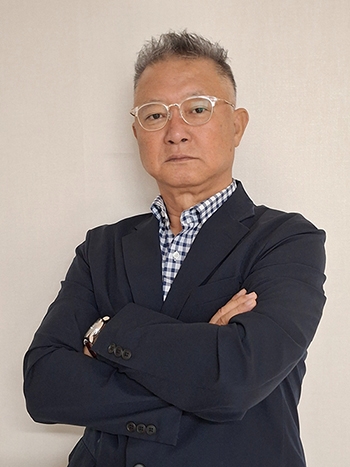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2023년 기준 개인사업자 1217만 명 중 816만 명이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이며, 소득 0원 신고자도 105만 명에 달한다. 이는 단순 경기침체가 아닌 유통 생태계 구조적 붕괴를 보여준다. 과잉 진입과 소비 위축, 고정비 상승이 겹치며 생계형 사업 구조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은 포화 상태에 이르며 경쟁이 극도로 과열됐다. 임대료와 인건비, 원자재비, 배달 수수료 등 고정비 부담이 급증하며 순이익은 거의 남지 않는다. 많은 소상공인은 버티기에 급급하며, 새로운 성장 전략과 경영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 정체는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 내수시장과 상권은 동시에 위축된다. 정부가 단기적 자금 지원에만 집중한다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임대료 완화와 수수료 구조 개편,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10월 황금연휴와 중국 국경절 특수로 외국인 소비가 급증했다. 유커의 대규모 입국으로 명동과 강남 일대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대형 유통사들은 면세점과 백화점을 결합한 VIP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흐름은 골목상권 침체와 대비된다.
반면 대형마트는 여전히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긴 연휴 동안 소비가 여러 날로 분산되며 식품 매출이 하락했고,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는 더욱 위축했다. 백화점과 편의점 중심의 소비 구조는 지역 유통 균형을 무너뜨리며 정책적 전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갑작스러운 일기 변동과 기온 하락으로 아웃도어와 침구류 판매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수익은 백화점 중심으로 집중됐다. 중소 유통업체는 소비 위축과 원자재·인건비 상승의 이중 압박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자본 집중 현상은 유통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 온라인 패션 시장은 19개월 연속 매출 감소세를 이어가며 장기 불황 국면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소비 양극화가 악재로 작용하며 SPA 브랜드 중심 저가 제품만 꾸준히 판매되는 반면, 고가 명품 브랜드는 단기 할인 행사로 방어에 급급하며 경쟁 압력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400억 원 규모 수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현장 체감도는 매우 낮다. 단기적 자금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위기를 막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과 정책의 초점을 단순 지원에서 재구조화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1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대기업 유통망 의존도가 높아서 골목상권 접근이 제한적이다.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지원은 일정 효과가 있으나 실질적인 자생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상공인 육성 정책도 생계형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대통령의 유통 구조 개혁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 기조에 따라 업계 가격 조정과 할인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형 유통기업과 제조 대기업, 편의점 등은 모두 가격 인하로 민생 부담을 완화하려 하지만, 고물가와 내수 위축, 원재료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
필자는 업종 전환, 기술 창업, 상권 재구조화, 디지털화 등 중기 전략을 강조한다. 데이터 경영과 브랜딩, 세제·임대료·수수료 개편이 병행되지 않으면 자영업 몰락과 지역경제 붕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단기 처방을 넘어 공정 시장 질서와 상생형 유통 모델 구축에 나서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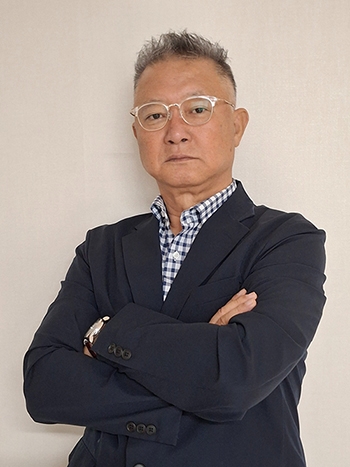





![[뉴욕증시] 美 경제지표·日銀 통화정책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21308002108093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