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북녘땅인 강원도 평강군 추가령계곡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철원·포천·연천을 거쳐 전곡에서 임진강과 합류할 때까지 136㎞에 이르는 강으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화산 폭발로 형성된 강이다. 13만~50만 년 전 북쪽 평강의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을 이루고 있는 한탄강은 지질학적으로 특이한 지형도 많아 지질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적연은 구절양장 흐르는 한탄강이 빚어 놓은 절경 중에서도 명승 제93호로 지정됐을 만큼 특히 빼어나다. 예로부터 화적연은 금강산 가는 길목에 있어 시인·묵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경승지였다. 조선시대 박순·박제가·박세당·이항로 등 많은 선비가 화적연을 노래했고, 금강산 유람에 나섰던 겸재 정선도 화적연의 절경에 반해 붓을 들어 화폭에 담았다. 겸재가 일흔 살 넘어 금강산을 그린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 속에 ‘화적연’이 들어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안내판에는 어느 농부가 오랜 가뭄에 시달리다가 화적연에 와서 한탄하니 용이 하늘로 오르면서 그날 밤부터 비가 내렸다는 전설이 적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선조·인조·숙종·영조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 기록들이 전해질 만큼 화적연은 오랜 가뭄이 들면 나라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조선 후기 학자 김창흡은 화적연을 두고 “가뭄에 기도하면 응하고 가을 곡식이 산처럼 쌓였네”라고 읊기도 했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짙푸르던 강물은 강추위에 얼어붙은 채 흰 눈에 덮여 있고 ‘노적가리’ 닮은, ‘용머리’ 같기도 한 거대한 바위도 눈을 이불처럼 덮고서 깊은 동면에 든 듯하다. 한탄강의 여울져 흐르는 물소리와 눈을 쓸고 가는 겨울바람 소리만이 주인인, 인적 없는 겨울 화적연에선 사람도 풍경이 된다.
손이 시릴 정도로 바람이 맵차다. 강 건너 절벽엔 주상절리도 보이고, 화산석인 현무암을 비롯해 여러 바위와 돌들이 강변을 메우고 사람들이 쌓아 놓은 돌탑도 눈에 띈다. 혹한의 추위 속에 강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강물이 여울져 흐르는 강의 중심에선 소용돌이치는 물소리가 제법 요란하다. 눈 덮인 강 위를 조심조심 걷다 보니 누군가 던지고 간 돌들이 흔적인 양 얼음에 박혀 있다. 문득 ‘어린 눈발들이 강물 속으로 뛰어내려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 안도현 시인의 ‘겨울 강가에서’란 시가 생각났다.
맵찬 북풍에 귀가 떨어질 것만 같은 혹한의 겨울도 오는 봄을 막지는 못한다. 뒤 강물이 앞 강물을 밀고 가듯 그렇게 계절은 돌고 돌며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을 선물처럼 펼쳐 보인다. 아직 오지 않은 계절을 기다리며 지금의 계절을 탓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춥다고 마냥 움츠려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멋진 풍경 속을 걸으며 겨울 낭만에 젖어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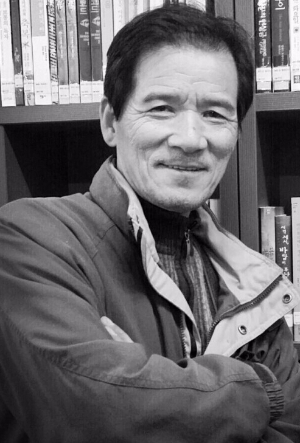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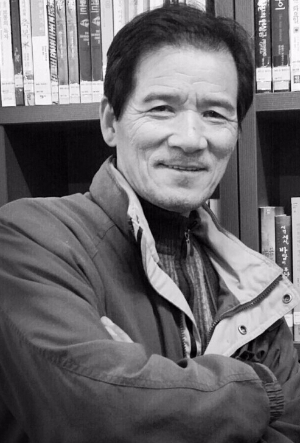




![[뉴욕증시] MS發 'AI 회의론'에 혼조세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13006554206548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