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I 해설은 대신증권 '대신TV' 유튜브 채널(구독자 21만)에 소개된 "파이브가이즈, 블루보틀, 잘나가던 브랜드도 한국만 들어오면 망한다?"를 다루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 2시간 웨이팅이 5분 주문으로... 변한 풍경
압구정 매장 앞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웃돈을 주고 햄버거를 되파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5년 전 '커피의 애플'이라 불리며 화려하게 데뷔한 블루보틀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픈 첫날부터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그 브랜드들이 지금은 어떨까?
파이브 가이즈는 이제 배달앱으로도 손쉽게 주문할 수 있는 평범한 브랜드가 됐고, 블루보틀은 그저 비싼 카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화려한 등장과 달리 의외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글로벌 F&B 브랜드들. 한국 시장이 이들에게 무덤이 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
▲숫자로 보는 현실... 매출은 올라도 수익은 글쎄
실제 수치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진다. 파이브 가이즈는 진출 첫 해인 2023년 1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듬해 매출을 4배 성장시키며 3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미국 본사에 내는 로열티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덕분에 진출 2년 만에 매각설까지 돌고 있다.
쉐이크쉑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높은 재료비와 인건비, 설비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 2022년 진출한 슈퍼두퍼는 더 가혹했다. 바로 다음 해 17억 원 순손실을 기록하고 올해 초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다. 3년 만의 일이다.
블루보틀의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 작년에는 겨우 2억 원에 그쳤다. 캐나다 국민 커피 팀 홀튼은 2028년까지 150개 매장 목표를 세웠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전국에 23개만 남아있다. 최근에는 국내 직영점을 처음으로 폐쇄하기도 했다.
한때 한국 매장이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스무디킹은 서서히 잊혀지더니 올해 완전히 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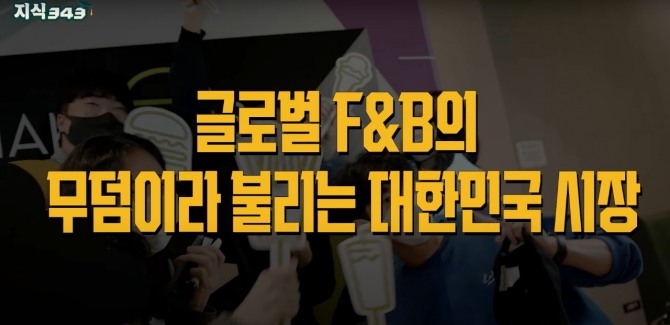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실패의 3가지 공통분모
1. 가격의 벽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쉐이크쉑 기본 버거는 9,200원, 세트로 구성하면 2만 원을 훌쩍 넘는다. 파이브 가이즈는 기본 햄버거가 1만 원이 넘고, 베이컨과 치즈를 추가하면 버거 하나가 17,400원에 달한다.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세트 가격의 2~3배다.
고든 램지버거는 더 극단적이다. 버거 단품 평균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한다. 몇 만 원씩 주고 버거를 자주 먹을 소비자는 많지 않다.
글로벌 브랜드는 본사에 로열티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팀 홀튼의 경우 캐나다 현지에서는 저렴한 가성비 브랜드로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블랙 커피가 현지보다 두 배 비싼 3,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전국에 3,000개 이상의 초저가 커피 브랜드가 깔려있고, 스타벅스마저 할인을 하는 한국 커피 시장에서는 치명적이다.
2. 현지화의 부재
많은 글로벌 브랜드가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블루보틀은 커피 맛에 집중한다며 매장에 와이파이와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았다. 한국 소비자에게는 큰 불편함이었다. 현지화 메뉴 개발에도 소극적이던 블루보틀은 실적 부진으로 6년 만에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3. 빠른 트렌드 변화
한국은 유독 입소문과 SNS에 민감하고, 유행이 빠르게 바뀐다. 탕후루나 두바이 초콜릿처럼 유행으로 떴던 브랜드들은 '인증샷'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매력을 잃는다. 신선함만으로 얻는 프리미엄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 사례에서 찾는 해답
물론 모든 글로벌 브랜드가 실패하는 건 아니다. 현지화에 성공한 브랜드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사이렌 오더'를 도입했다. 빨리빨리 문화에 맞춰 앱으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제주 까망라떼, 할라봉 천혜향 블렌디드 등 지역 특색을 담은 한정 메뉴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덕분에 커피 전문점 브랜드 평판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지역 농가와 협업한 한정 메뉴들로 대박을 터뜨렸다. 익산 고구마 모차렐라 버거, 창녕 갈릭버거, 보성 녹돈 버거 등이다. 특히 창녕 갈릭버거는 출시 한 달 만에 158만 개가 팔려 다음 해 재출시됐다. 지난 5년간 매출이 지속 상승해 작년에는 1조 원을 넘겼다.
버거킹은 2025년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햄버거 브랜드 1위에 올랐다. 사모 펀드 인수 후 콰트로 치즈 와퍼 같은 신메뉴 출시, 드라이브스루 매장 확대, 배달 서비스 도입, 24시간 영업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요소를 모두 도입했다. 매장당 평균 매출이 두 배 가까이 올라 매입가의 두 배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성공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합리적인 가격, 한국인 맞춤 현지화, 트렌드에 덜 민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다.
▲사모 펀드, 양날의 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글로벌 F&B 브랜드는 사모 펀드가 운영하고 있다. 버거킹, KFC, 피자헛은 물론 명륜진사갈비,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 국내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사모 펀드가 F&B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수한 현금 창출 능력 때문이다. 대부분 매출이 현금이나 카드로 즉시 발생해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 먹고 마시는 업종 특성상 경기 변동에도 둔감해 안정적이다.
버거킹 인수 사모 펀드는 실제로 매장당 매출을 두 배 올리고 매입가의 두 배에 매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단기 수익 개선에만 몰두하면 문제가 생긴다. 2019년 사모 펀드에 인수된 맘스터치는 패티 크기 논란과 가맹점주 갈등을 빚었다. 홈플러스나 피자헛처럼 회생 절차를 밟거나, 미국 레드랍스터처럼 파산하는 사례도 있다.
▲더 치열해질 미래, 생존 전략은?
한국 F&B 시장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식품 물가는 OECD 38개국 중 2위다. 지난 5년간 농축수산물 가격은 22%, 인건비는 17% 올랐다. 김밥 한 줄이 5천 원을 넘는 시대에 2만 원짜리 햄버거 세트를 선뜻 사 먹을 소비자는 많지 않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테스트 마켓이 됐다. 살아남으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 수익성과 소비자 눈높이를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 가격 정책
- 한국인이 좋아할 메뉴와 시스템 개발하는 현지화 전략
- SNS 인증용으로만 포지셔닝되지 않는 균형 잡힌 브랜드 아이덴티티
-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같은 어려운 과제 해결
해외 진출한 한국 브랜드들도 약 28%가 3년 안에 철수할 정도로 만만치 않다. 자국 내 성공이 해외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처지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LA에서 K-디저트 열풍을 일으키는 노티드, 몽골·태국·일본에서 성공한 맘스터치, LA 2호점을 내며 불고기 디럭스 버거로 호평받는 롯데리아 등이 그 예다. 이들 모두 현지화에 주력하며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시장을 제대로 사로잡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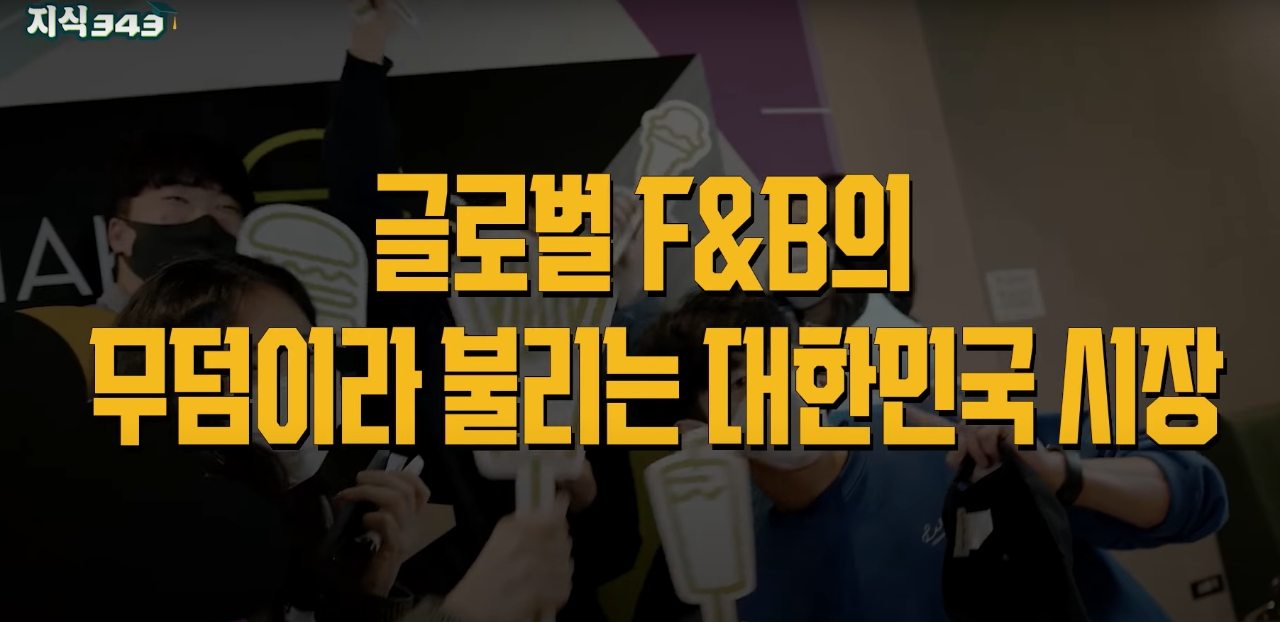







![[초점] 미디어텍·TSMC 손잡고 2나노 SoC 첫 테이프아웃](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91909230500346fbbec65dfb1161228193.jpg)
![[초점] 한화오션, 드릴십 '타이달 액션' 브라질서 첫 시추 개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91908574805857fbbec65dfb2101781272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