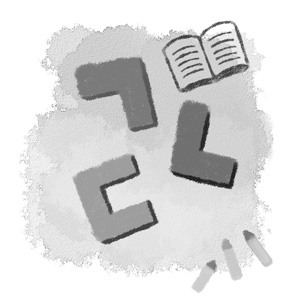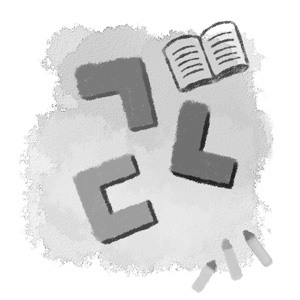먼저 <아양 떨다>를 살펴보자. ‘아양’은 본디 한자 액엄(額掩)에서 나온 말로, 액엄이 ‘아얌’으로 바뀌었고 종래에는 ‘아양’으로 발음하게 되었다. 아양은 양반가나 기생 혹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의 여인들이 겨울철 나들이할 때 머리에 쓰던 쓰개(일종의 방한모)다.
겉은 고운 털로 되어있고 안은 비단으로 덧대었다. 이를 쓰게 되면 이마 부분 눈썹 바로 위까지 붉은색 수술이 흔들리고, 뒷머리에서 등허리 중간까지는 <아얌드림>이라 하여 댕기처럼 길게 늘어뜨린 비단이 현란하다. 이 아얌을 쓴 여인들이 사뿐사뿐 걸을 때 이마 부분의 붉은 술과 뒷부분의 드림이 좌우로 흔들거리며 주위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된다. 이런 모습에서 여인들이 남의 시선이나 이목을 끌려고 하는 행동이나 말을 <아양 떨다>로 빗대어 쓰게 되었다. 따라서 아양 떠는 표현은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소매 치다> 혹은 <소매치기>가 있다. 이 말은 주로 남자 한복의 폭 넓은 소매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 전통 옷에는 본래 주머니가 없었다. 따라서 이동 중에 지녀야 할 돈이나 귀중한 물건은 한복 윗저고리의 품이 크고 넓은 소매에 넣고 양팔을 낀 상태로 다니게 된다. 이러다보니 소매는 좀도둑의 먹잇감이 되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치기 당하기 십상이었다. 대원군 섭정 당시 한복의 소매가 좁아지면서 물건을 넣는 주머니가 등장한다. 따라서 도둑의 목표물이 주머니로 바뀌지만 주머니가 털렸다 해도 여전히 <소매치기 당했다>는 말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다. 참고로 주머니를 ‘호주머니’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의 ‘호’는 중국 청나라를 일컫는 것이고, 청나라의 옷인 <호복>에는 원래부터 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머니를 한복에 적용하며 호주머니라 하였다.
특히 <오지랖 넓다>의 사전적 의미는 '무슨 일이든 주제넘게 남의 일에 앞장서서 참견하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비유한다. 실례로 "그런 일까지 참견하다니 오지랖도 참 넓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염치없이 행동하는 면이 있다'는 뜻도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오지랖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뺑덕 어미는 풍성한 오지랖을 말아 올리고 청이에게 젖을 물렸다'에서처럼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자신의 자식은 물론 남의 자식에게도 젖을 물린다는 의미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주는 희생정신을 말하기도 한다. 남의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도와주고자 무던히 애쓰는 사람이나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 자기 시간, 자기 돈 써 가면서 바쁘게 사는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이런 긍정적 의미를 지녔음에도 현대에서는 아무래도 부정적 의미로 더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홍남일 한·외국인친선문화협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