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DSR)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세대출, 서민금융상품, 중도금 대출 등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급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커지자 이중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또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에 이어 혼합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적용 등도 추진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로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DSR 규제 강화와 혼합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다. 지난 8월에는 25개월 만에 최대치인 6조9000억원이 증가했고, 9월에는 2조4000억원, 10월에는 6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이 취급한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16년 36조원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162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 수준에서 올 상반기 15%까지 높아졌다.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에 전세자금대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이 공적보증을 바탕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특히 전세자금이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다른 유형의 대출에 비해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가계대출의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자금대출의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 가계부채 관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짐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DSR 규제 대상으로는 당초 예정되어있던 변동금리 뿐만 아니라 혼합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자금대출 DSR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데다,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을 통해 “과도한 대출 및 주택경기에 미치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DSR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중도금 대출, 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등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대출 DSR 도입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인 만큼, 규제 시행 시 가계부채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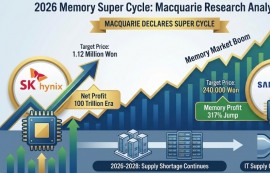





![[일본증시] 닛케이평균 반락 속 반도체·메모리주 급등...키옥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00107443406877fbbec65dfb2101781272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