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글로벌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고 임금이 상승하는 점도 고금리 장기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나홀로 호황, 지정학적 위험 확대,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장기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범위하게 정치적 지정학적 상황이 변하면서 통화 정책의 공간이 좁아지고, 노동인구가 줄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대의 지속적인 강력한 임금 상승은 탈세계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반대로 다수의 국가가 한꺼번에 노령화에 직면하고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도 Z-세대의 청년실업률은 수십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의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최근 전년 대비 13%를 기록한 반면, 25세에서 54세 사이의 근로자들은 6%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0~40여 년에 비해 인플레이션은 평균적으로 100~150bps 정도 더 높아졌다.
이어 2010년대에는 2% 인플레이션이 상한이자 목표였지만, 향후 인플레는 2~3%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맞춰서 인플레 통제에 집중했던 중앙은행 정책도 보다 더 유연해지며 과거보다 높아진 인플레의 수준을 인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미국이 나홀로 호황을 보이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해 연말이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도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금리인하 기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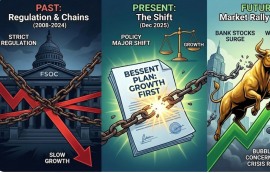

![[뉴욕증시] AI 관련주 약세 속 3대 지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21306330308913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