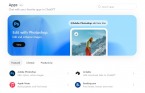하지만 '월 적립식' 저축보험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를 설정한 것을 놓고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월 적립식 보험은 전체 저축보험의 84%에 달한다. 또 월 적립식 보험 중 월 납입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850만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한다. 부자보다 ‘중산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 최소 10년 부터 20년 동안 매달 돈을 쪼개 적립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법안을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처럼 부자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저축보험 가입 비율을 보면 소수에 불과하다.
문제는 세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축보험 특성상 세수 효과는 최소 10년 후 발생하는 데다, 부자들도 비과세 한도까지만 납입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당장 발생할 부작용은 명징하다. 가입 여력이 있는 중산층은 비과세 축소에 가입을 안 하게 된다. 비과세가 또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생존권에 직격탄을 맞게 된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최악의 경우 소득보전을 위해 좋지 않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고차원 방정식을 단순한 ‘부자증세’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한 건 아닌지 아쉬운 대목이다. 이해 당사자인 보험업계는 물론 실제 저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면면을 살펴봤는지 의문이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