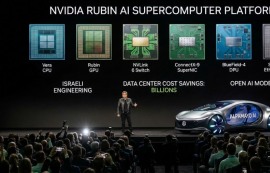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 대다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원하지만 집권 보수당인 자유국민연합이 한 석 차이로 정권을 잡고 있고, 두 주요 정치 진영이 거의 막상막하인 상황에서 탄광의 갑작스러운 중단이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소수의 선거구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주의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잠재적 재생 에너지 초강대국이지만 여전히 전기의 70%와 수출의 약 4분의 1을 화석 연료로부터 얻는다는 호주의 국가 정책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보유한 광대한 석탄 산업의 종식을 재촉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선거운동이 5월 21일 투표일 이전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스포트라이트는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자메이카 크기의 와인과 석탄생산지로 유명한 헌터에게 떨어졌다.
이 지역은 2년 전 호주의 "블랙 서머" 산불로 황폐화되었지만, 화석 연료 판매에 의존하는 것은 호주 기후 딜레마의 연결고리이다. 게다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세계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에서 호주를 거의 침묵하게 만든 정치적 마비가 이뤄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헌터의 노동자 10명 중 거의 1명은 탄광 산업에 직접 고용되어 있다. 이것은 중도좌파 노동당의 112년 동안 안전한 베팅이 되게 한 블루칼라 유산이다. 최근 선거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을 가속화하겠다는 노동당의 약속은 많은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놀라게 했다. 한때 화석 연료 분야를 지지하기 위해 의회에서 석탄 덩어리를 휘둘렀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합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위협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헌터를 이기는 것은 모리슨이 권력을 잡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2019년 마지막 선거에서 노동당의 강력한 기후 변화 행동 약속은 정부에 9%의 흔들림을 초래했다. 이번 달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을 경우 모리슨의 당이 처음으로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미묘한 균형 잡힌 행동이다. 모리슨과 야당 지도자인 앤서니 알바네즈는 국가 전체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후에 대한 신임장을 갈고 닦고 있다.
그러나 헌터에서는 정치 캠페인이 일자리를 구하고 석탄 산업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지속되도록 약속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매슈 스완 뉴캐슬항 사업개발담당자는 1년에 1억5000만 톤 이상의 연료 선적 부두가 내려다보이는 사무실에서 "헌터밸리 석탄은 세계 최고의 석탄이기 때문에 아직 석탄 시장이 남아 있지만 헌터밸리의 광산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완의 말은 노동당의 헌터 후보인 댄 레파콜리의 특이한 지지자를 찾아냈다.
선거 운동에서, 레팔콜리는 지역 광산과 사업체들에서 오는 노동자들과 쉽게 유대감을 형성하지만, 정당 광부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명성은 강력한 기후 변화 입장 때문에 잠식되었다.
노동계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43%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82%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며 2050년까지 순수 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모리슨 정부에게 균형 잡힌 행동은 훨씬 더 어렵다. 세계 최초의 탄소 거래 프로그램 중 하나를 해체하고 오염자들을 크게 처벌하는 것을 거부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그의 보수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