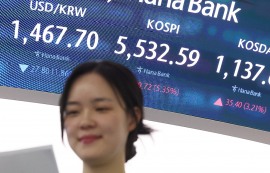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정부 주도의 생산 확대 정책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조금과 토지·세제 혜택에 힘입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시장 수요보다 생산 목표를 앞세운 정책이 업계 전반을 악순환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 재고 넘치는 판매망…‘좀비 차량’ 속출
로이터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의 한 쇼핑몰 매장에서는 5000대가 넘는 신차가 전시돼 있으며 일부 차종은 출고가 대비 절반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현지 업체 Z카는 “제조사와 대리점에서 대량 매입한 차량을 헐값에 유통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조사에서는 중국 내 자동차 판매점의 70%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미판매 차량을 일괄 등록·보험 처리한 뒤 ‘판매 완료’로 잡는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량은 주행거리가 ‘0km’인 상태로 중고차로 둔갑해 내수와 해외 시장에 흘러들고 있다.
◇ 정부·지방의 과잉 투자 경쟁
자동차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로이터는 “중앙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자 지방정부가 유치 경쟁에 나섰다”면서 “이는 토지 제공·보조금 확대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안후이성 창펑현은 2021년 비야디에 저가 토지를 제공하며 대형 공장을 유치했고 이후 지역 경제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베이징은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연간 최소 470억 위안(약 6조6000억 원) 매출 목표를 부과했다. 광저우시는 연간 10만대 이상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업체에 최대 5억 위안(약 960억 원)의 보조금을 약속했다.
◇ 외국 브랜드도 ‘설 자리’ 잃어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내수 판매에서 외국 업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올해 1~7월 외국 브랜드 점유율은 31%로, 2020년 62%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럽 각국은 값싼 중국산 차량 유입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안보와 불공정 경쟁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차량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았다.
◇ 업계 “생존 가능한 기업 10여곳뿐”
로이터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능력은 연간 5500만대에 달하지만 실제 판매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전했다. 알릭스파트너스는 현재 129개에 달하는 중국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브랜드 가운데 2030년까지 생존 가능한 업체가 15곳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샤오펑 창업자인 허샤오펑 샤오펑 최고경영자는 “2030년까지 연 300만대 이상 판매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지방정부는 대량 실업과 소비 위축을 우려해 부실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 악순환 장기화 우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