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WIFT 배제 이어 FDPR 실시…스마트폰 수출 어려워져
애플, 아이폰 러시아 판매 중단…'점유율 1위' 삼성 눈치
샤오미, 제재 동참 '사면초가'…중국·러시아 한쪽은 타격
애플, 아이폰 러시아 판매 중단…'점유율 1위' 삼성 눈치
샤오미, 제재 동참 '사면초가'…중국·러시아 한쪽은 타격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를 위해 해외직접제품규제(FDPR)를 실시한 가운데 적용 예외 대상에서 미국 주요 우방국 중 한국만 빠졌다.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실시한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은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FDPR에 적용되면 미국 밖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대한 세부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스마트폰은 소비재로 FDPR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반도체를 사용하는 만큼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쟁사인 애플이 러시아에 아이폰 판매를 전면 중단하면서 삼성전자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또 애플은 러시아에서 자사의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제한했으며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매체인 RT뉴스, 스푸트니크뉴스를 내려받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자발적으로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삼성전자는 난감한 위치에 놓였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연간 출하량은 약 3000만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4.5%의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어 샤오미가 28.1%로 2위, 애플이 14.7%로 3위에 자리잡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할 경우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가 막 출시된 상황에서 주요 시장 중 하나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다.
샤오미 등 중국 기업의 사정은 더 복잡하다. 중국도 FDPR 제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샤오미가 이를 무시하고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은 캐나다에서 1000여일 동안 가택연금 되기도 했다.
만약 샤오미가 이 같은 위험을 고려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면 중국 시장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미국에 반발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체계가 긴밀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면 반미 정서를 가진 중국 소비자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자칫 중국 내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경제 제재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전쟁 상황을 지켜보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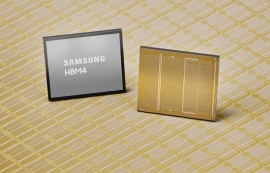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