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DNA 때문이다. 조상대대로 익숙하게 먹어 왔던 먹거리에 내 몸의 DNA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익숙한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 몸은 가장 쉽게 받아들인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내 몸에 맞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식품이나 새로운 형태의 음식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몸 안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정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적응기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제대로 소화·분해되지 못한 물질이 있으면 생소한 이물질로 착각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가 항상 접해왔던 식품이 아니라면 혹시나 나를 해치려는 물질은 아닌가,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현상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신체 활동 중에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알레르기나 아토피와 같은 현상들도 포함된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도 모두 같은 쌀이 아니라 미세한 차이로 인해 우리 몸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민감하게 반응하는 쌀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사람마다 건강상태가 달라 생소한 물질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메밀속의 소화 분해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 식품이나 글루텐프리 제품 또는 락토스프리 제품 등과 같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한 식품들의 등장이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적응기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선인들이 좋은 음식으로 우리 주변, 가까이서 생산되는 음식과 계절음식을 강조한 데에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산지식이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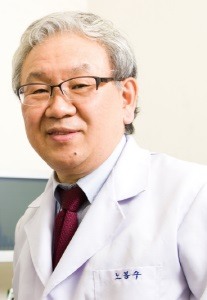





![[뉴욕증시] FOMC 의사록·물가지표에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1504005307100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