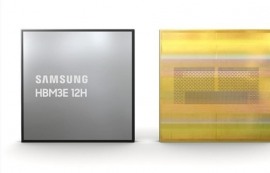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채근담에 나오는 경구이다. 양보는 아름다운 미덕이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데 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들에게 종종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눈에 띄게 보이는 임산부를 위한 ‘핑크카펫’을 볼 수 있다. 노약자석의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가 앉을 자리가 부족하여 그들만의 자리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즉,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약자에 대한 양보와 친절이라는 위대한 생각이 필요하고 절실한 요즘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십중팔구는 고개 숙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와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자리 앞에 누가 있는지 볼 여유가 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민족이다. 밥상머리에서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식사를 먼저 하지 않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고 배우며 자라왔다. 또한 외출을 나가고 들어올 때는 늘 어른들께 문안을 드렸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디지털세대가 급증하였다고 하지만 친절과 매너는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인위적인 친절이 아니라 몸에 자연스럽게 익힌 ‘친절한 문화’를 배우며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을 들여다보면 과잉친절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친절이 전국민의 습관이 되었다. 그들의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승용차 사이에서 서로 양보하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체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경적을 울리는 일도 아주 적다. 친절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보행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에 대해 수십년전부터 고민하고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심지어 고객만족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친절이다. 기업에서 친절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직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노사간의 관계, 경영진과 직원의 관계, 고객사와의 관계, 팀간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와 같이 복잡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사회관계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영리 추구가 목적인 관계로 우리 사회에서 친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A kindness is never lost. 번역하면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대면하고 있다. 때로는 친절이 습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순간 헛되지 않은 친절을 베풀어보자. 우리 스스로 약속하자.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은 하나도 없다.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임주성 플랜비디자인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