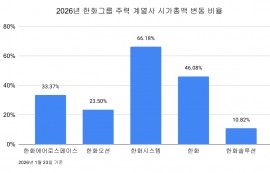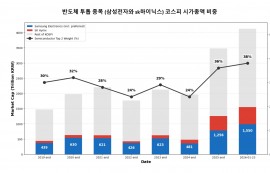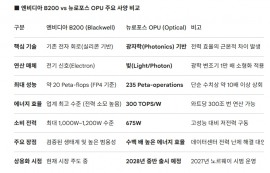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예금자 보호제도가 생긴 것은 전두환 정권 때였던 1982년 봄에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거액어음사취사건’, 속칭 ‘장영자 사건’ 때문이었다. 사고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했다. 경제 규모가 작았던 당시에는 천문학적 규모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거액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83년에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기금을 출연한 ‘신용관리기금’이 발족했다.
당시 신용관리기금이 갚아주기로 한 예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였다. 가구당 평균소득이 월 28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한 금액이었다.
이유는 보호한도를 올릴 경우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따라서 높아지고, 이는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일부 ‘고액예금자’에게 편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지금은 소문만으로도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