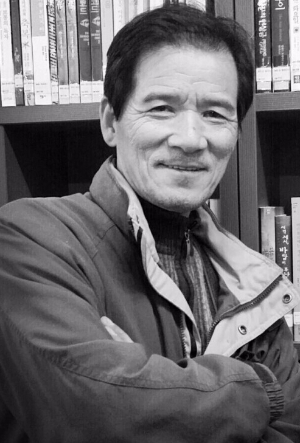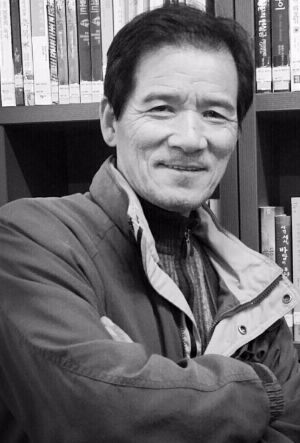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카뮈는 가을을 두고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고 했던가. 온 산이 다비식이라도 치르는 듯 거대한 하나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며 눈길 닿는 곳마다 황홀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평일임에도 등산로엔 산객들로 붐비고 저마다 산을 향하는 발걸음이 경쾌하다. 북한산성 입구에서 출발하여 행궁지와 남장대지를 거쳐 부왕동암문까지 갔다가 부왕사지를 지나 계곡을 따라 원점 회귀하는 코스를 택해 단풍 속을 걸었다. 단풍에 취해 걷다가 문득 고개 들면 우뚝 솟은 암봉들이 비에 씻겨 수려한 자태를 뽐내고 한나절 밟히는 낙엽들이 깊어진 가을을 이야기한다.
색색의 단풍 사이로 노란 산국과 흰 구절초, 보랏빛 꽃향유가 마지막 가을 향기를 풀어놓고 계곡을 흘러내리는 맑은 물 위로는 낙엽들이 떠간다. 잠시 등산로를 벗어나 계곡에서 다리쉼을 할 때 카펫처럼 깔린 낙엽 위에 대자로 벌렁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옆으로 일곱 걸음만 걸어봐. 다른 세상이 보일 거야.” 오래전에 보았던 소설 속의 한 문장이 생각났다. 이렇게 속없이 누워 하늘을 본 게 언제였던가. 단풍나무 가지 사이로 조각난 쪽빛 하늘가,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햇솜 같은 흰 구름이 느리게 떠간다. 문득 시간이 정지된 듯 사방이 적막하다.
길 위에 떨어진 산사나무 열매를 주워 입에 넣으니 새콤달콤하다. 어렸을 적 고향 마을엔 단 한 그루의 산사나무가 있었다. 서리가 내리고 산사나무 열매가 선홍빛으로 익으면 아이들은 수시로 그 나무에 올라 그 열매를 따 먹었다. 간식거리가 귀하던 시절이라서 주인 할아버지의 불호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장대지를 지나다가 참회나무를 만났다. 도봉산에서 자주 보이던 참회나무와 사촌간이라 할 수 있는 참빗살나무의 열매는 꽃보다 곱다. 보라색이 감도는 분홍의 만두 모양의 봉합선이 갈라져 드러난 빨간 열매가 매혹적이다. 저 뿌리칠 수 없는 매혹의 열매는 산새들의 귀한 겨울 양식이 되어줄 것이다. 새들 또한 그 열매를 먹고 힘찬 날갯짓으로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씨앗을 퍼뜨려 참빗살나무의 고마움에 보답할 것이다.
낙엽귀근(落葉歸根), 소슬바람이 불 때마다 그늘진 건너편 골짜기로 가랑잎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잎은 져서 다시 뿌리로 돌아가고 나무들은 제 발등을 덮은 낙엽에 싸여 봄을 기다린다. 화려한 단풍의 향연도 곧 끝이 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쩍 예전엔 무심히 지나치던 환절의 길목이 자꾸 눈에 밟힌다. 단풍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내게 몇 번의 가을이 남아있을지 남몰래 헤아려 보는 새로운 버릇도 생겼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눈에 보이는 꽃 한 송이, 솜털을 간질이는 바람 한 올에도 무심할 수가 없다.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변의 은행나무가 쿨럭쿨럭 기침하듯 은행잎을 뭉턱뭉턱 내려놓는다. 색의 향연이 끝나면 겨울이 들이닥칠 테지만 겨울은 봄을 향해 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해도 미리 주눅 들 까닭은 없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한 오늘이 마지막인 듯, 영원히 살 것처럼 나아가야 한다.
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