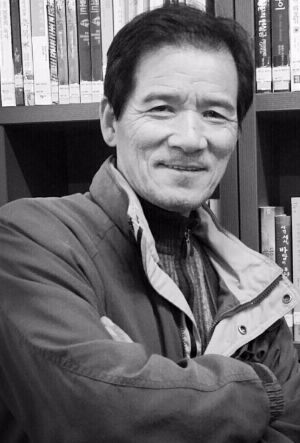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매화는 매실나무의 꽃이다. 매실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한국·일본에 분포하는 장미과의 소교목으로 키는 5m 정도까지 자란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인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고, 잎보다 먼저 꽃이 핀다. 꽃이 진 뒤에 맺히는 열매가 매실인데 3000년 전부터 식품이나 약재로 사용했다. 매실은 둥근 모양으로 5~ 6월에 녹색에서 누렇게 익는데 과육이 80% 정도인데 수분이 85%, 당분이 10% 정도 된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 정원수로 전해져서 고려 때부터 약재로 사용했다고 한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피로 해소와 체질 개선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꽃인들 예쁘지 않으랴마는 매화는 옛 선비들이 유난히 아끼던 꽃이었다. 매화를 보며 자신도 고난을 딛고 멀리 맑은 향기를 전하는 매화 같은 사람이기를 바랐다. 소나무·대나무와 더불어 추위를 견디는 ‘세한삼우’로 칭했다. 매화를 좋아했던 시인을 꼽자면 중국에서는 북송 때 매처학자(梅妻鶴子)로 불린 임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편의 매화에 관한 시를 쓰고 ‘매화 화분에 물을 주어라’는 유언을 남긴 퇴계 이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내 집에도 매화도가 한 점 걸려 있다. 시커먼 매화나무 고목의 등걸 위로 홍매·백매가 소담스레 피어 있는 그림은 날마다 바라봐도 질리지 않는다. 가만히 그림을 보고 있자면 매향이 내게로 건너오는 듯 청신한 기운을 내게 불어넣어 준다.
“화분에 매화꽃이 올 적에/ 그걸 맞느라 밤새 조마조마하다/ 나는 한 말을 내어놓는다/ 이제 오느냐/ 아이가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올 적에/ 나는 또 한 말을 내어놓는다/이제 오느냐// 말할수록 맨발 바람으로 멀리 나아가는 말/ 얼금얼금 엮었으나 울이 깊은 구럭 같은 말// 뜨거운 송아지를 여남은 마리쯤 받아낸 내 아버지에게 배냇적부터 배운” -문태준의 시 ‘이제 오느냐’
김천 출신의 문태준 시인이 쓴 매화에 대한 시도 눈길을 끈다. 특히 매화를 두고 ‘피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한 표현은 절창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오느냐”란 말 속엔 오랜 기다림의 시간과 기다리는 동안의 마음 졸인 불안과 반가움이 함께 녹아 있다. 그래서 더욱 뜨겁고 깊은 말이다.
흔히 말하기를 “봄은 기다려도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고 한다. 뒤 강물이 앞 강물을 밀고 가듯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 계절은 다음 계절을 향해 간다. 비록 지금의 삶이 팍팍하다 해도 지레 겁을 먹거나 체념할 일은 아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매화를 그리듯이, 이 힘든 시간을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란 희망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삶이 고단할수록 꽃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 또한 줄어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마음에 꽃을 품고 살다 보면 누구나 꽃 피는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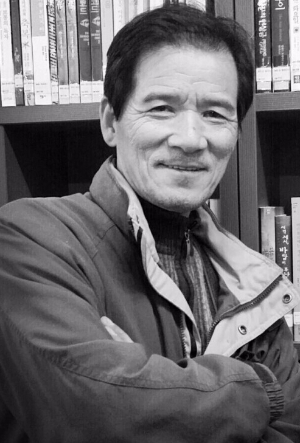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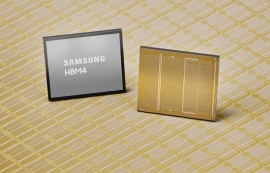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