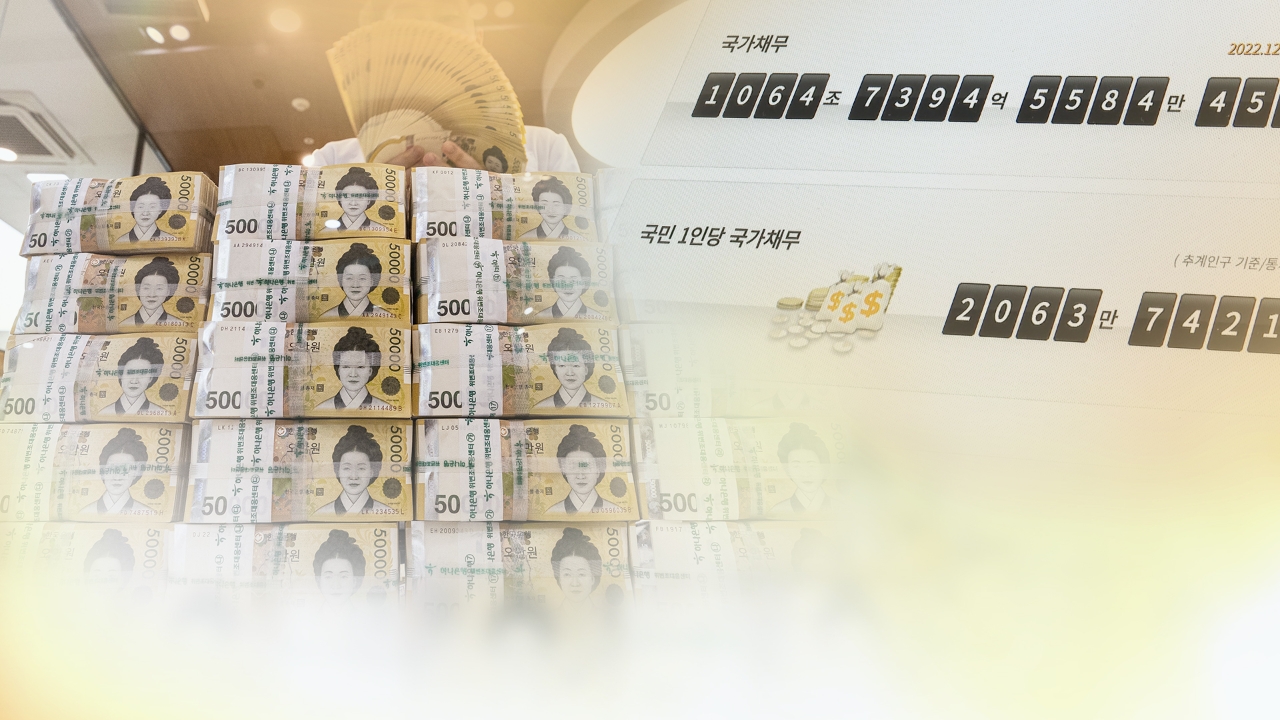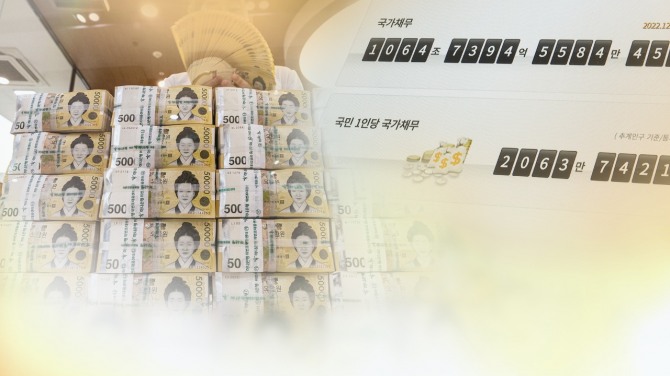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외환이나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성이 불필요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줄인 대신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결과다.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나 아동수당·기본수당 등 복지지출을 늘릴 경우 나랏빚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경기 부진과 세금 감면 등으로 인한 세입 기반은 악화 일로다.
세금으로 고스란히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적자성 채무에 대한 관리 목표조차 찾기 힘들다.
세수 결손은 국내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나빠졌다는 의미다. 게다가 2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인한 5300억 원의 세수 감소도 결손을 키운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 탕감을 추진 중이다. 대상자는 48만 명 정도고, 금액은 5조4000억 원이다. 이들만 구제하면 같은 조건에서 빚을 갚은 361만 명은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다중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정치 상황에 따라 채무 탕감 요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관례화될 여지가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