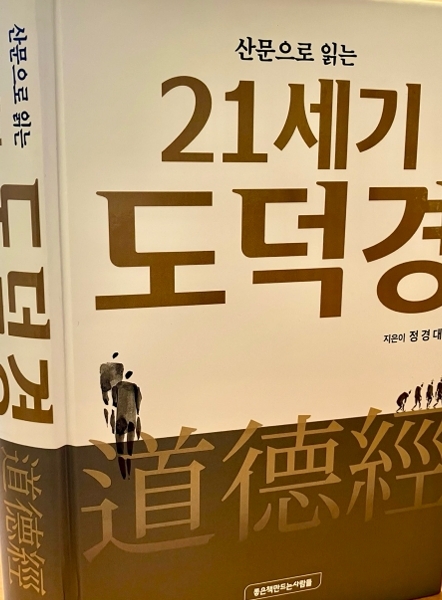'산문으로 읽는 21세기 도덕경' 제36장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붓다는 특히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금강석같은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음을 다스릴 때 웬만큼 강한 의지는 언제든 끓어오르는 번뇌에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였을 것이다. 실제 명상 수행에서 아무리 강한 의지로 번뇌를 누르려 해도 뜨거운 물에 넘치는 물거품처럼 더 심하게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하지만 이때 부드럽게 미소를 머금으면 신통하게 번뇌가 사그라든다. 붓다의 그윽한 미소가 그런 뜻이 아닐까?
노자는 도를 깊은 연못에 비유하고,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같은 뜻으로, 붓다는 본성 도를 벗어난 탐욕은 재앙이요 고통이라 하였다. 물속에서 보는 바깥세상이 아름답다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두말할 것 없이 허연 배를 드러내고 퍼덕이다가 죽는다. 이때 연못은 물고기가 살아 숨 쉬는 이로운 그릇이다. 노자가 비유한 연못은 사람의 본성이 머무는 마음자리, 즉 심체(心體)이고 물고기는 탐욕을 쫓아가다가 재앙을 초래하는 인간 자신이다.
이 장의 핵심 내용이 이와 같은데, 둘째 구절에, '장욕탈지 필고여지 시위미명(將欲奪之 必固與之 是謂微明)'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 해석을 대부분 '장차 빼앗으려면 먼저 주어라' 하고 단정한다. 그리 해석하면 셋째 구절 이하 모든 구절과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노자는 도덕경 첫 장 첫 구절부터 81장 마지막 구절까지 도와 덕만을 논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구절에서 교묘한 계책이나 상술, 또는 타인의 마음이나 재물 등을 빼앗기 위한 비열한 방법을 제시했을까? 노자는 결코 도에서 벗어난 말을 단 한 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여섯째 구절의 국(國)은 나라 또는 세상 세계이고, 연못은 도이다. 인간의 본성 역시 도이다. 그리 생각하면, 물고기가 연못 바깥세상이 좋다고 연못 밖으로 나와 숨을 헐떡이다 죽듯, 사람은 탐욕에 매몰돼 본성 도에서 벗어나 세속의 즐거움에 빠지면 재앙을 입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교훈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전체 뜻을 간추리면 탐욕을 버리고 욕심이라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에 필요한 만큼 조금만 욕심을 내라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혀 욕심을 안 낼 수는 없는 법, 큰 욕심을 줄이고 줄여서 삶에 필요한 만큼만 욕심을 내어도 미묘한 밝음에 이른다는 노자 선생의 교훈은 물질문명에 자아를 상실해가는 사람들이 가장 귀 기울여야 할 고언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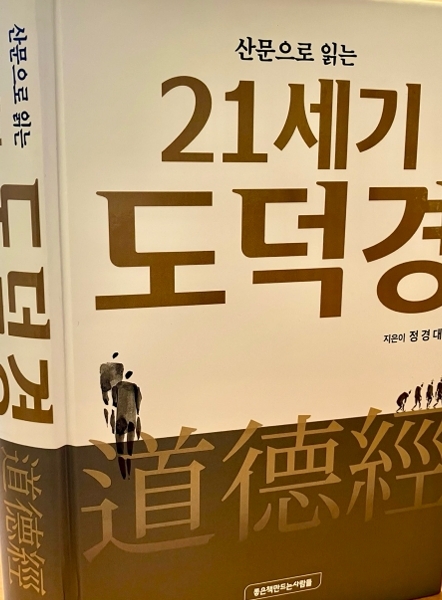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경대 한국의명학회 회장(종교·역사·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