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처서가 지나면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고, 한해살이풀들은 더는 물을 길어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농부들은 처서가 지나면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농기구를 손질하고 추수 준비를 하고 논두렁·밭두렁의 풀을 베고 산소의 벌초를 한다. 해를 따라 돌던 해바라기는 이제 돌기를 멈추고 나무들도 서서히 겨울 채비를 시작한다. 처서가 지나면 벼 이삭도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강한 햇볕과 쾌청한 날이 지속되어야 벼 이삭이 잘 여물어 풍년을 기대할 수 있다. 옛사람들은 처서 무렵에 비 한 번 올 때마다 벼 한 섬이 줄어든다고 했다. 긴 여름을 견디고 마침내 맞이한 9월, 가을로 가는 길목이 기분 좋은 선물로 가득하다.
한낮의 햇살 속엔 여전히 여름이 남아있으나 뺨을 스치는 기분 좋은 산들바람엔 가을 향기가 묻어난다. 가로변의 무궁화가 만발하고 보랏빛 벌개미취도 한창인 걸 보면 우리가 여름을 탓하는 동안 이미 자연 속엔 가을빛이 들어차고 있었던 게다. 여름내 무성하게 자란 호박 넝쿨에도 호박이 달리고, 골목길을 산책할 때면 바람에 떨어진 푸른 감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 요즘 가장 내 눈길을 잡아끄는 꽃은 단연 유홍초다. 비록 작은 꽃이기는 해도 눈길을 사로잡는 선홍색의 꽃은 매혹적이다. 들길에서 유홍초를 만나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곤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유홍초는 한해살이 식물로 예쁜 꽃 모양과 매혹적인 색감 때문에 요즘은 관상용으로 많이 심기도 하는데 내겐 특별한 추억이 담긴 꽃이기도 하다.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단둘이 고향에 살 때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내 고향에선 유홍초 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꽃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어렵사리 씨앗을 구해 고향집 꽃밭에 뿌렸다. 줄을 매어주었더니 넝쿨이 자라 줄을 타고 오르며 무럭무럭 자랐다. 여름이 깊어지면 별 같은 꽃들이 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 어느 날 외출에서 돌아왔더니 거실 창문을 발처럼 가리던 유홍초 덩굴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어머니께 물었더니 창문을 가리고 지저분해서 뽑아 버렸다고 했다. 그해 유홍초를 보려던 나의 꿈은 어머니로 인해 허무하게 끝이 났지만, 그 이듬해부터는 어머니가 정성으로 유홍초 꽃을 가꾸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다.
계절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꽃은 없다. 여름이 뜨겁다고 투정하는 사람은 있어도 계절을 탓하며 피지 않는 꽃은 어디에도 없다. 우주의 시간이 여름과 가을의 경계를 지날 때 찬란하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있으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나의 무지를 반성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단단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게 된다.
마침내 9월이다. 어느 날 갑자기 9월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9월이 오기까지의 긴 시간을 헤아려보라. 우리가 참고 견딘 세월이 얼마나 알찬 열매를 품고 키워왔는지 생각해보라.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산책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지금은 흰 부추꽃에게, 9월에게 인사를 건네야 할 때다. 9월아,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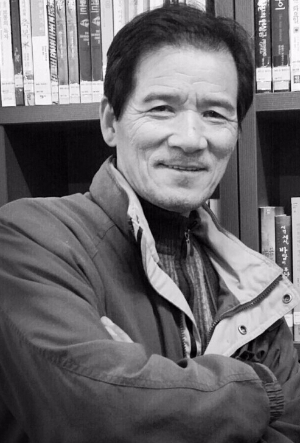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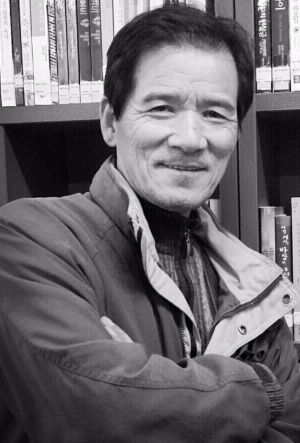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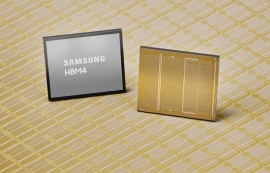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