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국제정치학 박사)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콘센트에 꽂혀 있는 동안 전기를 조금씩 흡수하는 기기들을 두고 붙여진 말이었다. 예컨대 TV를 꺼둔 채 플러그를 꽂아둔 경우, 충전기를 단말기에 연결하지 않고 콘센트에 꽂아둔 경우, 또는 셋톱박스가 밤새도록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불빛을 깜박이며 전력을 소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이지 않는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전력 소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다.
오늘날 전력계통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AI가 혁신의 상징이자 미래 사회의 엔진으로 각광을 받는 동시에, 막대한 전력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흡혈귀’로 지적받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는 한순간도 발전기와 전력 공급망 없이는 버틸 수 없다. 초대형 GPU 클러스터가 가동되는 순간, 소도시 전력 사용량에 버금가는 전기 소비가 이뤄진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 곳곳에서 ‘AI 전력 충격’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과연 에너지의 적일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AI는 분명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지만 동시에 다른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철소의 고로는 AI의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석유화학 플랜트 역시 AI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 불필요한 가동 중단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 교통 분야에서는 AI 기반 신호체계 도입으로 차량 정체 시간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감축한다. 요컨대 AI는 스스로 ‘흡혈귀적 소비자’이면서도 다른 영역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율의 설계자’이기도 한 셈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균형이다. 인공지능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 흡혈귀적 속성을 길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데이터센터 자체의 효율 혁신이 중요한 과제다. 지금까지 막대한 전력이 사용되던 냉각 과정에서 LNG 냉열이나 해수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부산·울산항 인근에서 논의되는 LNG 냉열 활용형 데이터센터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및 분산 전원의 접목이 절실하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데이터센터 전용으로 구매 계약(PPA)을 체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 단위의 마이크로그리드와 연계한다면 전력망 전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책적 조건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은 단순히 많은 공급이 답이 아니다. 유연성(Flexible), 안정성(Stable), 가격경쟁력(Affordable), 청정성(Clean)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전력의 불안정성이 곧 산업 경쟁력 전체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전력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와 사회 인프라 모두가 위험에 처한다.
우리의 과제는 AI가 가진 전기 흡혈귀적 특성을 지혜로운 설계와 혁신적 에너지 전략을 통해 길들이고, 이를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I와 전력 문제를 둘러싼 고민은 단순히 기술의 영역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질문이 되고 있다. AI 시대의 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며, 우리는 한 발 앞선 시각으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



















![[뉴욕증시] 빅테크 강세 속 3대 지수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602232607989be84d8767411822112019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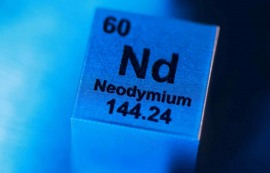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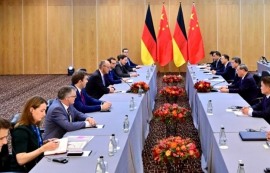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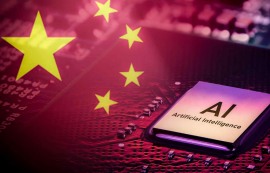
![[속보] 아이온큐, 양자 기업 최초 매출 1억 달러 돌파... 주가 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06595208229e250e8e1883912361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