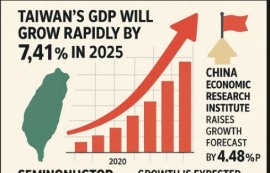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올 상반기에만 34조1220억 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에 늘어난 가계부채(13조8300억 원)의 2배를 웃돈다.
한은 자금순환표에 잡힌 가계부채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민간 비영리단체 부채까지 합친 액수이긴 하다. 아무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올라간 상태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도 씀씀이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의 경우 소득 수준 대비 부동산 지출 비중도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부동산 편중을 바로잡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1% 가계의 부동산 비중은 79.4%다. 순자산 10% 구간에서도 부동산 자산 비중은 75.2%이고, 상위 50%의 경우도 70% 이상이다.
국내 가계의 상당수가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상위 1% 자산가의 경우 부동산을 13.1%만 보유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17조127억 원이다. 제조업 대출 잔액 447조735억 원과 비교하면 적지만 증가 추세는 매우 가파르다.
1997년 이후 부동산 대출 증가액은 200배를 넘는다. 금융권에서 토지나 건물 등 안전한 담보대출을 선호한 탓이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면 국가경제의 생산성과 성장률에도 부정적이다.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경제 선순환을 복원해야 할 시점이다.



















![[뉴욕증시] 3대 지수↓...산타랠리 '숨고르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22705594801330be84d87674118221120199.jpg)